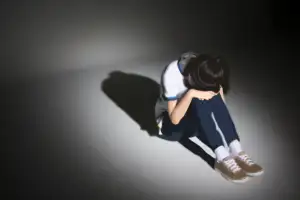대학시절 공부한답시고 여러차례 기거한 고향 절의 노스님은 참으로 특이했다. 새벽부터 예불은 하지 않고 절 주변에 개간한 밭에서 일을 했다. 틈이 나면 인근 계곡을 돌며 놀러온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주웠다. 죽어서 신세지기 싫다며 자신의 관을 미리 짜서 학생들이 있는 요사채 지붕 밑에 놓아둬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불공차 찾아오는 시골 아낙들이 이고 오는 것은 쌀 정도가 고작이었지만 스님은 학생 기숙비 등을 아껴 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새경을 넉넉하게 쳐줬다. 때문에 산 아래 마을에서는 “절에 가면 부자 된다.”라는 말이 돌았다.
지난 여름 오랜만에 찾은 절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노스님이 돌아가신 뒤 새로 온 스님이 많은 돈을 들여 수리를 한 덕택이라고 한다. 하룻밤을 자며 젊은 스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풍채 좋은 스님은 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더니 “촌 보살들이 이게 있어야지. 내가 여기저기서 불사 좀 했지.”라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얘기를 들을수록 노스님의 존재가 커져만 가는 것은 어인 일인지.
김학준 지방자치부 차장 kimhj@seoul.co.kr
지난 여름 오랜만에 찾은 절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노스님이 돌아가신 뒤 새로 온 스님이 많은 돈을 들여 수리를 한 덕택이라고 한다. 하룻밤을 자며 젊은 스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풍채 좋은 스님은 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더니 “촌 보살들이 이게 있어야지. 내가 여기저기서 불사 좀 했지.”라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얘기를 들을수록 노스님의 존재가 커져만 가는 것은 어인 일인지.
김학준 지방자치부 차장 kimhj@seoul.co.kr
2006-10-1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