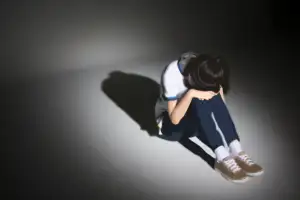어느 날 문득 가을이 우리 곁에 왔다.소매 끝을 스치는 바람결이 어제와 다른가 싶어 먼 산을 바라보니,산빛도,강가에 나뭇잎 부딪치는소리도 어제와 다르다.우리 몰래 세월이 벌써 이렇게 훌쩍 흐른 것이다.둘러보면 산 뿐이 아니다.태풍에 시달린 나무 이파리들도 상처를쓰다듬으며 어느새 색깔이 퇴색해 간다.큰물에 쓰러진 개울가의 고마리꽃이며,물봉선화며,구절초도 꽃을 환하게 피웠다.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나무와 풀들은 한 계절을 정리하고 있다.쓰러졌으면 쓰러진 대로,꼿꼿하게 서 있으면 서 있는 대로 그것들은 살아 온 세월 앞에 고개를 수그리며 익어간다.
논두렁을 넘어 찰랑찰랑 익어가는 벼며,콩 밭에 키 큰 수수도 제 무게로 고개를 숙였다.큰바람 속에서도 제 몸을 잘 간수하여 붉어져 가는 대추야,감아,알밤들아,모든 바람을 이긴 곡식들아,풀들아,나무들아 콘크리트 벽 속에서 소주를 마시며 더위를 이겨 낸 사람들아,모두 애썼다.작고 크든 시련을 딛고 일어선 것들은 산들바람부는 이 가을 하늘아래 모두 눈부시다.
밤길을 걸으며 풀섶에서울어대는 풀벌레 울음소리,깊은 밤 어디선가 낭랑하게 우는 귀뚜라미 소리,한 계절의 이 쓸쓸한 모퉁이를 돌아가며,나는 문득 소슬해지는 어깨를 추스린다.나는 잘 살았는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그러므로 가을은 남보다 자기를 들여다보게 하는,자기에게 더 외로운 계절이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가.내가 온 힘을 기울여 애쓰는 이 수고가 세상의 어디에 소용이 된단 말인가.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내 몫인 것 같은 이 재물과 권력과 지식은 얼마나 하찮고 부질없는 것들인가.세월은 바람같이 빠르고 인생은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다만 이 세상에 남을 것은 진실 뿐임을 알 때 생은 경이로워진다.눈 앞에 놓여 있는 커다란 떡에 눈 멀면 훗날 그 떡보다 더 큰 욕을 먹는다는 것을 알라.한줌 권력이 저 들에 피어있는 들꽃보다 낫다는 생각을 나는 해보지 않았다.
‘사랑의 온기가 더 그리워지는/가을 해거름 들길에 나는 서 있습니다/먼 들 끝으로 해가 눈부시게 가고/산그늘도 묻히면/길가에 풀꽃처럼 떠오르는/그대 얼굴이/어둠을 하얗게 가릅니다/내 안의 그대처럼/꽃들은 쉼없이 피어나고/내 밖의 그대처럼/풀벌레들은/세상의 산을일으키며 웁니다/한 계절의 모퉁이에/그대 다정하게 서 계시어/춥지않아도 되니/이 가을은 얼마나 근사 한지요/지금 이대로 이 길을 걷고 싶고/그리고 마침내 그대 앞에/하얀 풀꽃 한 송이로 서고 싶어요’ 어느 가을.나는 힘없고 가난한 내 사랑에 따뜻한 온기가 되고 싶어,해지는 들길에 앉아 이 시를 썼다.
내가 근무하는 작은 학교 운동장에 서늘한 산그늘이 내려온다.아이들이 놀다 돌아간 운동장은 산뜻하게 비어 있다.소슬바람이 부는 산아래 나는 두 손을 편히 내려놓고 서서 산을 올려다본다.어쩌면 산은 저리 변함이 없을꼬? 산그늘은 천천히 내려오며 작은 마을을 덮고 푸른 강을 건너 앞산을 오른다.해 지는 동네도,강변에 풀잎들도 참 곱다.서산에 걸린 해에서 쏟아지는 햇살에 발광하는 저 찬란한 가을논과 강물의 풍경을 함께 보는 일은 행복하다.
보아라,저 메밀잠자리들은 내가 밥 한 숟갈 주지 않았어도 푸른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저 풀잎들은 그대가 눈길 한번 주지 않았어도 저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간다.
가을이다.이 가을 저 들에 풀잎 한 포기,한톨의 곡식인들 어찌 내게 무심하리.한 계절의 모퉁이는 돌며 나는 나에게 진정 다시 묻고 싶다.너의 가을은 저 파란 우리나라 가을하늘처럼 참말로 근사한가? [김 용 택 시인]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나무와 풀들은 한 계절을 정리하고 있다.쓰러졌으면 쓰러진 대로,꼿꼿하게 서 있으면 서 있는 대로 그것들은 살아 온 세월 앞에 고개를 수그리며 익어간다.
논두렁을 넘어 찰랑찰랑 익어가는 벼며,콩 밭에 키 큰 수수도 제 무게로 고개를 숙였다.큰바람 속에서도 제 몸을 잘 간수하여 붉어져 가는 대추야,감아,알밤들아,모든 바람을 이긴 곡식들아,풀들아,나무들아 콘크리트 벽 속에서 소주를 마시며 더위를 이겨 낸 사람들아,모두 애썼다.작고 크든 시련을 딛고 일어선 것들은 산들바람부는 이 가을 하늘아래 모두 눈부시다.
밤길을 걸으며 풀섶에서울어대는 풀벌레 울음소리,깊은 밤 어디선가 낭랑하게 우는 귀뚜라미 소리,한 계절의 이 쓸쓸한 모퉁이를 돌아가며,나는 문득 소슬해지는 어깨를 추스린다.나는 잘 살았는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그러므로 가을은 남보다 자기를 들여다보게 하는,자기에게 더 외로운 계절이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가.내가 온 힘을 기울여 애쓰는 이 수고가 세상의 어디에 소용이 된단 말인가.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내 몫인 것 같은 이 재물과 권력과 지식은 얼마나 하찮고 부질없는 것들인가.세월은 바람같이 빠르고 인생은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다만 이 세상에 남을 것은 진실 뿐임을 알 때 생은 경이로워진다.눈 앞에 놓여 있는 커다란 떡에 눈 멀면 훗날 그 떡보다 더 큰 욕을 먹는다는 것을 알라.한줌 권력이 저 들에 피어있는 들꽃보다 낫다는 생각을 나는 해보지 않았다.
‘사랑의 온기가 더 그리워지는/가을 해거름 들길에 나는 서 있습니다/먼 들 끝으로 해가 눈부시게 가고/산그늘도 묻히면/길가에 풀꽃처럼 떠오르는/그대 얼굴이/어둠을 하얗게 가릅니다/내 안의 그대처럼/꽃들은 쉼없이 피어나고/내 밖의 그대처럼/풀벌레들은/세상의 산을일으키며 웁니다/한 계절의 모퉁이에/그대 다정하게 서 계시어/춥지않아도 되니/이 가을은 얼마나 근사 한지요/지금 이대로 이 길을 걷고 싶고/그리고 마침내 그대 앞에/하얀 풀꽃 한 송이로 서고 싶어요’ 어느 가을.나는 힘없고 가난한 내 사랑에 따뜻한 온기가 되고 싶어,해지는 들길에 앉아 이 시를 썼다.
내가 근무하는 작은 학교 운동장에 서늘한 산그늘이 내려온다.아이들이 놀다 돌아간 운동장은 산뜻하게 비어 있다.소슬바람이 부는 산아래 나는 두 손을 편히 내려놓고 서서 산을 올려다본다.어쩌면 산은 저리 변함이 없을꼬? 산그늘은 천천히 내려오며 작은 마을을 덮고 푸른 강을 건너 앞산을 오른다.해 지는 동네도,강변에 풀잎들도 참 곱다.서산에 걸린 해에서 쏟아지는 햇살에 발광하는 저 찬란한 가을논과 강물의 풍경을 함께 보는 일은 행복하다.
보아라,저 메밀잠자리들은 내가 밥 한 숟갈 주지 않았어도 푸른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저 풀잎들은 그대가 눈길 한번 주지 않았어도 저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간다.
가을이다.이 가을 저 들에 풀잎 한 포기,한톨의 곡식인들 어찌 내게 무심하리.한 계절의 모퉁이는 돌며 나는 나에게 진정 다시 묻고 싶다.너의 가을은 저 파란 우리나라 가을하늘처럼 참말로 근사한가? [김 용 택 시인]
2000-09-2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