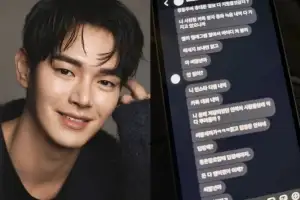오우암의 작품에선 작가의 독특한 이력만큼이나 깊은 상처가 느껴진다.6·25때 부역한 부친을 잃고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독학으로 그림을 배운 그는 지난 20여년간 고집스레 이미 오래전 보았던 상처의 기억만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해왔다.
서울 신문로2가 아트포럼뉴게이트에서 19일부터 열리는 ‘오우암 〉 길’전에 선보이는 작품들에선 이같은 상처의 응어리들이 선명하게 재현되어 있다. 침침한 기차역 내부를 울타리 바깥에서 호기심에 들여다보는 아이, 직업소개소 앞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 극장 매표소 앞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
특이한 것은 등장 인물들이 하나같이 표정이 없고, 건물이나 육교, 기차 등 오브제들이 대부분 칙칙하게 묘사되었다는 점. 화면엔 또 많은 길이 보인다. 역, 철길, 굽은 산길 등등. 길은 어디론가 떠날 수 있다는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절망의 시대에 한가닥 희망을 찾아 떠나고 싶었다는 잠재된 욕구가 읽혀지기도 한다.
그림을 좋아했지만 미술공부는 엄두도 못낸 작가는 책의 삽화나 화집 등을 보고 화법을 스스로 익혔다. 유화물감을 만져본 것도 20여년밖에 안 된다. 미술대학에 들어간 딸이 그리다 망친 캔버스 뒷면에 자투리 물감으로 그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칠순에 가까운 작가는 작품소재로 아픈 기억을 계속 고집하는데 대해 “생각이 당시에 머물러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는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다.”라고 말한다.
마치 어린 나이에 더이상 성장하기를 거부한 귄터 그라스 소설 ‘양철북’의 주인공 소년처럼, 작가는 50년대에 멈추어 더 이상 기억이 자라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고아소년으로 깊숙이 맺힌 상처의 응어리가 풀어질 때까지 말이다.7월1일까지.(02)737-9011.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6-06-19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