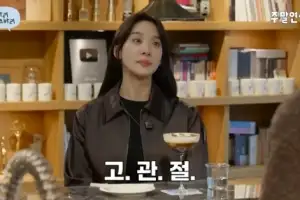현실보다 더 퀭한 어두운 자화상
영양실조로 굶어죽기 직전 포대기 속에 잠든 듯 누워 있는 어린 두 아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내려다 보는 어머니의 고통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때가 1984년. 그의 네번째 소설집 ‘환멸을 찾아서’의 표지화로 콜비츠의 ‘프롤레타리아’ 시리즈 중 한 작품을 채택할 때 화집을 들추다 발견한 에칭 판화 한 점이 바로 ‘시립구호소’였다. 이미 그 이전부터 작가가 성장기에 겪었던 가난의 체험을 통해 못가진 자들의 설움과 분노를 작품에 담아왔던 그는 “많은 문장으로 짜깁기하여 엮어내는 소설보다 한 장의 그림이 주는 전달력이 훨씬 감동적임을 절감했다.”고 말한다.
이후 김원일은 독일을 여행하면서 콜비츠 화집을 구입했다. 작품을 집필하는 동안 책상 서가에 두고 글을 쓰다 지치면 그 화집을 들추며 콜비츠의 세계에 빠져들어 신음을 삼키는 게 큰 위안이 되었다는 것.
케테 콜비츠는 베를린의 노동자 거주지역에서 생활하며 일련의 사회성 강한 작품들을 생산했다. 직조공들의 폭동, 농민전쟁의 참상과 수난의 농민상, 아들이 희생당한 제1차 세계대전의 비극, 노동가족의 빈곤문제, 빈곤과 질병 속에 방치된 이름없는 그들의 죽음 등을 에칭·목판화·석판화로 제작하여 20세기 독일의 대표적인 판화가로 평가받았다.

김원일 소설가
유신정권 시절 간첩누명을 쓰고 희생됐던 젊은이 9인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 ‘푸른혼’에서 보듯 김원일은 여전히 사회의 음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붙들고 있다. 절대빈곤으로 굶어죽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천명에 이르고 굶주린 탈북자들이 중국을 떠도는 것에서 보듯,‘시립구호소’는 여전히 현실로 남아 있다는 게 작가의 생각이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6-07-1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