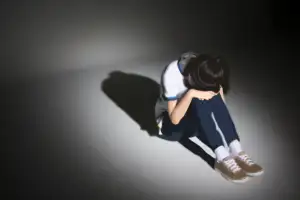미국의 대중국 외교가 보다 확실한 실리외교로 선회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 보도했다.
WSJ은 부시 외교팀이 과거 중·미관계의 단골 메뉴였던 인권 및 민주화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고 대신 경제 및 안보협력에서의 실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유의 확산’과 ‘폭정 종식’을 외교 기조라고 강조해 오던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도 19·20일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입 조심’ 중이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전처럼 중국의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촉구하고 티베트 등 소수민족 문제를 들춰내 중국을 자극하는 대신 위안화 절상, 금융부문 등 시장개방 확대 등 ‘발등의 불’을 끄고 실질적인 이득을 얻어내는 데 주력하겠다는 자세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9일 워싱턴을 방문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만나면서도 전과 달리 관련 사진을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고 기자들을 부르지도 않는 등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애썼다.
지난주 홍콩 봉황TV와의 회견에서도 부시는 “무역, 지적재산권, 북한, 이란과 에너지, 반테러협력 등이 베이징 방문중 논의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예전과 달리 ‘자유와 민주’는 거론하지도 않고 실질적 협력과제만 나열했다.
WSJ는 “중국의 전제정권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신보수주의자들의 영향력보다 중국과의 협력확대를 요구하는 기업계 인사들의 입김이 커진 탓”이라고 분석했다. 부시 외교팀에서도 “중국을 자극해 소외시키는 우를 범하는 대신 국제사회의 규칙과 제도안에 포용해 나가야 한다.”는 대화 주장파들의 목소리가 커진 까닭이다.
마이클 그린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도 중·미 관계가 갈등과 협력이 교차하는 미묘한 관계임을 전제하면서도 “부시 대통령은 중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할 때도 ‘건설적 자세’로 접근했었다.”며 협력관계의 확대를 강조했다.
민주화, 인권, 소수민족문제 등에 있어선 유연한 자세로 후진타오 정권의 체면을 세워주는 대신 무역역조, 위안화 절상 등에선 보다 확실한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계산이다.
클린턴 대통령때 중국대사를 지낸 제임스 세서는 “중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미국이 깨달았다.”며 실용적인 외교로의 변화를 환영했다.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때 주중대사를 지낸 제임스 릴리도 “민주화문제 같은 것이 미·중 협력관계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는 분위기”라고 변화된 상황을 지적했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