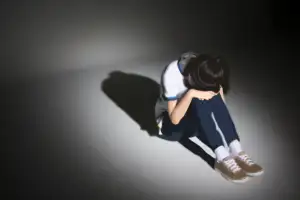처음엔, 신기한 표정으로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는 그들이 신기했다. ‘어머~ 이런 동네도 있네’ 하며 기웃대는 중년의 그네들이, 갓 하루 된 ‘이런 동네 사람’의 처지로 기연미연 신기했다. ‘그런가? 신기한가?’
풀어 놓은 이삿짐이 자리를 찾고, 집 둘레를 돌던 발자국이 점점 멀어지던 어느 날, 그네들이 동네 어귀에 터뜨려 놓고 간 말이 절로 입속을 맴돌다 새어 나왔다. ‘정말 이런 동네가 다 있었네.’ 소설가 엄흥섭이 서울 바닥에선 만금을 주고도 사지 못할 양미만괴(凉味萬魁)라 했던, 북악산 자락의 부암동은 그렇게 도심 속 시골의 속살을 마루 끝 처마그늘에 던져진 달빛마냥 조용히 내보였다.
대형 마트도 없고, 변변한 학원도 없고, 빵빵한 집도 없고 그래서 땅 투기도 없는 곳. 그래서 좋지 않으냐 묻는 바람이 담쟁이덩굴을 간질이곤 도롱뇽 물질하는 백사실 계곡으로 미끄럼 타는 곳. 공영주차장 없어도 좋으니 그냥 이대로 살게 내버려 달라며 구청에 하소연하는 주민들이 사는 곳. 부쩍 늘어난 셔터 소리에 사람들이 몰려들까 점점 겁이 나는, 그냥 그곳.
진경호 논설위원
풀어 놓은 이삿짐이 자리를 찾고, 집 둘레를 돌던 발자국이 점점 멀어지던 어느 날, 그네들이 동네 어귀에 터뜨려 놓고 간 말이 절로 입속을 맴돌다 새어 나왔다. ‘정말 이런 동네가 다 있었네.’ 소설가 엄흥섭이 서울 바닥에선 만금을 주고도 사지 못할 양미만괴(凉味萬魁)라 했던, 북악산 자락의 부암동은 그렇게 도심 속 시골의 속살을 마루 끝 처마그늘에 던져진 달빛마냥 조용히 내보였다.
대형 마트도 없고, 변변한 학원도 없고, 빵빵한 집도 없고 그래서 땅 투기도 없는 곳. 그래서 좋지 않으냐 묻는 바람이 담쟁이덩굴을 간질이곤 도롱뇽 물질하는 백사실 계곡으로 미끄럼 타는 곳. 공영주차장 없어도 좋으니 그냥 이대로 살게 내버려 달라며 구청에 하소연하는 주민들이 사는 곳. 부쩍 늘어난 셔터 소리에 사람들이 몰려들까 점점 겁이 나는, 그냥 그곳.
진경호 논설위원
2009-10-2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