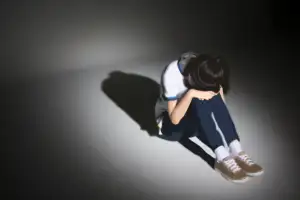검찰이 ‘일심회’를 이적단체로 결론짓고 조직총책과 조직원 등 5명을 국가보안법의 간첩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6·15 공동선언 이후 최대 간첩단 사건’으로 규정하고 일심회의 하부조직과 연루 의혹이 있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쪽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지하당 등 비합법적 조직 구축에 주안점을 뒀던 과거와는 달리 기존 정당의 중앙당과 서울시당에 침투해 통일전선체를 구축하려 한 것이 이번 사건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수십건의 국가기밀을 북한에 전하고 반미운동을 부추겼다고 한다.
‘일심회’사건은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간첩단사건이라고 공개적으로 규정한 뒤 경질되면서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을 증폭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주요 당직자가 연루된 민주노동당과 진보적인 ‘386’ 진영에서는 공안당국의 짜맞추기식 수사라며 반발한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일심회’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수사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양 진영의 이념대립이 첨예화하면서 근거없는 소문들이 꼬리를 물고 고소·고발과 항고·재항고,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되는 등 과거 공안사건 수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들이 쏟아졌다.
우리는 검찰이 ‘일심회’사건을 반국가단체가 아닌 이적단체로 규정한 점에 주목한다. 검찰로서도 그만큼 법 적용에 신중해졌다는 뜻이다. 또 변호인의 접견권을 보장하는 등 일반 형사사건에 준해 피의자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해줬다고 한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일심회’의 실체와 국가기밀을 북에 건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기소한 간첩행위도 ‘모르는 가운데 빚어진 우발적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진정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려면 앞으로 공판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기소사실을 철저히 입증해야 할 것이다.
2006-12-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