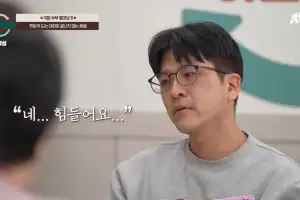20여년 만에 연필을 잡았다. 사삭 사사삭…. 촉감이 여전했다. 좀 무른 듯했지만 종이에 착착 달라붙는 것이 여간 감칠맛 나는 게 아니었다. 새하얀 A4용지가 낯선지 연필글씨는 제 ‘동무’들을 기억 속에서 불러냈다. 누런 갱지와 고무(지우개라 부르지 않았다), 그 갱지 양면에 빼곡히 끄적여졌던 영어단어들, 그리고 연방 연필에 침을 묻혀 쓰던 짝꿍놈까지….
연필이 반토막으로 줄어들면서 추억 하나가 더 떠올랐다. 궁상맞다 싶었지만 ‘재현’에 나섰다. 멀쩡한 볼펜을 해체하곤 연필 꽁무니를 들이밀었다. 그런데 이게 뭔가. 볼펜이 가늘어졌는지, 연필이 굵어졌는지 도무지 아귀가 맞질 않았다. 난감하고 씁쓸했다. 몇차례 시도에도 ‘합궁’에 실패하고 책상에 널브러진 볼펜 몸통과 반토막 연필…. 그건 오래 전 연락이 끊긴 친구의 부고나 다름없었다. 몽당연필은 추억 속에만 살아있었지 실제로는 세상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던 모양이다.
중학생 아들녀석 공책 글씨가 총천연색이다.“왜 볼펜을 써?연필이 안 나아?”“색깔 바꿔서 쓰면 공부가 더 잘돼요.” 추억에서마저 몽당연필이 사라질 날도 멀지 않은 게다.
진경호 논설위원 jade@seoul.co.kr
연필이 반토막으로 줄어들면서 추억 하나가 더 떠올랐다. 궁상맞다 싶었지만 ‘재현’에 나섰다. 멀쩡한 볼펜을 해체하곤 연필 꽁무니를 들이밀었다. 그런데 이게 뭔가. 볼펜이 가늘어졌는지, 연필이 굵어졌는지 도무지 아귀가 맞질 않았다. 난감하고 씁쓸했다. 몇차례 시도에도 ‘합궁’에 실패하고 책상에 널브러진 볼펜 몸통과 반토막 연필…. 그건 오래 전 연락이 끊긴 친구의 부고나 다름없었다. 몽당연필은 추억 속에만 살아있었지 실제로는 세상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던 모양이다.
중학생 아들녀석 공책 글씨가 총천연색이다.“왜 볼펜을 써?연필이 안 나아?”“색깔 바꿔서 쓰면 공부가 더 잘돼요.” 추억에서마저 몽당연필이 사라질 날도 멀지 않은 게다.
진경호 논설위원 jade@seoul.co.kr
2006-03-0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