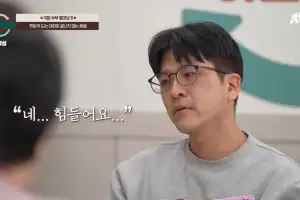죽지 못해 살아온 세월이었으리라. 일본 대사관앞에서 자살을 기도한 60대 할머니 말이다. 그는 원자폭탄 피해자. 피폭후의 한 많았던 삶을 죽음으로써 항의하며 청산하려 한 것이다. ◆일제때 강제징용된 아버지를 따라 갔던 그는 히로시마에서 변을 당한다.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귀국. 그러나 후유증에 시달린다. 더욱 무서운 것은 유전. 모든 피폭자가 겪어왔듯이 그 또한 뼈없는 아들을 낳기도 하고 살다가 죽는 자녀를 묻어야 했으며 정신질환에 걸린 딸을 데리고 살아야 했다. 호소할 곳도 없는 채 얼마나 원통하고 뼈아픈 삶을 이어 왔던 것인가. 그 누적된 분통이 한꺼번에 터진 자살기도였다. ◆이런 경우가 이노파 한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1945년 8월6일과 9일,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두 도시에 있던 한국인 7만명중 4만여명이 죽었다. 징용되어 간 사람들과 그 가족들. 목숨을 건진 3만명가운데 2만여명이 귀국한다. 그 무서운 후유증을 모른 채. 그들은 앓다가 죽어갔다. 지금까지 살아 있는 사람을 1만3천여명으로 치지만 정확한 숫자도 모른다. 자녀에의 「유전」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 스스로 숨기기 때문이다. ◆그들의 삶은 하나같이 비참했다는 것이 공통점. 그나마 국가적인 관심이 가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는다. 주의의 외면속에 그늘의 인생을 살아온 슬픈 역정은 「통석지념」정도 말재간으로 풀릴 한이 아니다. 패전후 정신이 없었을 때야 그렇다 치더라도 경제대국이 되면서 바로 마음썼어야 할 「한국의 피폭자」 아니었던가. 그들의 「절규」가 있기 전에. 노대통령 방일을 고비로 보상에의 길이 열리기는 했지만 어찌 「45년 한」까지 푼다고야 하랴. ◆지금의 핵무기는 45년전에 비길 것이 아니다. 양 진영 것이 터졌다 하면 지구는 몇십번 박살이 나고도 남는다. 그 점에서 양 진영의 화해무드는 바람직스러운 것. 하지만 핵무기는 여전히 존재한다. 피폭자의 슬픈 절규속에서도.
1990-06-1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