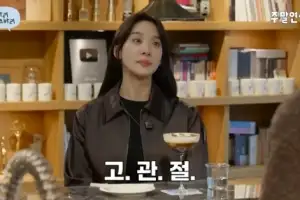이처럼 서구에서 근대민족국가 구성은 오랜 화두였다. 국가로서 개별 사람들을 국민으로 포섭한다는 것, 동시에 개별사람들이 국민으로서 소속감을 느낀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이 단일민족주의 전통이 강한 한국에서는 숨겨져 왔으나 최근 슬슬 고개를 들고 있다.‘방귀깨나 낀다.’는 분들의 원정출산 문제나 황우석 교수 윤리문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극단적 반발에서부터, 최근 유도선수 추승훈이나 골프선수 미셸 위·김초롱의 국적을 둘러싼 논란들이 그 증거다. 왜 원정출산은 분노를, 추승훈은 연민을, 미셸 위·김초롱은 자부심과 묘한 반감을 함께 불러일으키는가. 무엇이 황 교수 윤리문제를 두고 네티즌들을 격발시켰는가. 나에게 대한민국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참고할 만한 책이 나왔다.‘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는 것’의 의미, 즉 ‘공동체론’을 두고 프랑스의 두 석학 모리스 블랑쇼와 장뤼크 낭시가 주고받은 글을 묶은 ‘밝힐 수 없는 공동체/마주한 공동체’(문학과 지성사 펴냄)다. 알려졌다시피 블랑쇼는 기인으로 알려진 지식인. 최근 프랑스철학의 주요 경향인 ‘니체 르네상스’를 선도했던 인물이다. 낭시는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마르크스주의의 재정립을 꿈꾸는 급진 철학자다.
블랑쇼의 관심은 공동체라는 것이 ‘공동의 무엇’을 전제하는 순간 전체주의로 흘러가지만, 동시에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다. 그는 낭시의 ‘무위의 공동체’에 대한 답글인 ‘밝힐 수 없는 공동체’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한다. 이어진 낭시의 ‘마주한 공동체’는 블랑쇼의 ‘밝힐 수 없는 공동체’에 대한 대답이다. 여기서 낭시는 공동체는 ‘공동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인간의 조건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번역자 박준상 박사의 해설과 함께 자크 데리다의 글까지 함께 실려 있어 이해를 돕는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