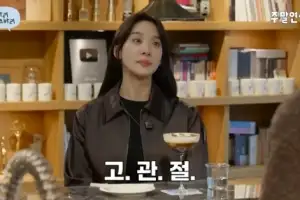여자들이 밥상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어머니가 남은 반찬 밀어주며 ‘이거 마저 먹어 치워라.’하는 소리이다.
내 친구 중의 하나는 그 말이 듣기 싫어 결혼을 했더니 시어머니는 그 보다 한술 더 떠서 ‘이거 마저 쓸어 먹어라.’하더라며 피할 수 없는 여자의 잔반처리 인생을 한탄했었다.
우리 세대는 딸들에게 절대로 ‘먹어 치우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으려는 노력도 있지만 다이어트 열풍 속에 사는 요즘의 딸들에게는 그런 말이야말로 여드레 삶은 호박에 이도 안 들어갈 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일매일 밥상에서는 뒀다먹기도 그렇고 버리기엔 양심에 걸리는 애매한 반찬들이 필연적으로 생겨나니 그 앞에서 갈등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기 입에 털어넣는 것으로 갈등을 무마해 버리는 일이 주부들 사이에서는 비일비재하다.
오늘 아침 우리집 밥상에서도 그런 풍경이 벌어졌다.“얘, 요거 한 숟가락이 안 들어가서 남겼냐?” 음식 버리면 당장 하늘에서 마른 벼락이 떨어지는 줄 아시는 70대의 우리 어머니.“할머니 진짜 못 먹겠어요, 그거 마저 먹으면 속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완강하게 잔반처리를 거부하는 10대의 딸아이.
“어머니, 남겨 두세요. 나중에 먹게 하지요 뭐.” 중재에 나서는 40대의 나.“고거 한 숟갈 나중에 먹게 안 된다. 이리 다오.” 마침내 50년 이상 익숙해온 바대로 잔반처리를 자임하는 우리 어머니.“아, 할머니, 제가 나중에 먹을 게요.” 그릇을 들어 올려 할머니의 손길을 피하며 애원하는 딸아이. 이쯤되면 해결책은 하나뿐이다.“이러면 다 됐죠?” 한숟갈 남은 음식을 내 입에 털어 넣으며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상황은 종료되었다.
딸아이에게서는 고마워하는 시선을, 어머니에서는 어쩌냐고 걱정하는 눈길을 받는 내 기분은 샌드위치 심정이었지만 어쩐지 어머니에게로 섭섭함의 저울이 기우는 것은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만고의 진리를 거스르지 못해서만이 아니다.
며칠전에도 어머니는 잔반처리 과식으로 속탈이 나셨고 더 전에는 맛이 가기 직전의 음식을 드시고 고생하신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어머니의 잔반처리 욕구는 소식으로 건강을 관리해야 할 중년의 나로 하여금 술상무를 닮은 잔반상무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는 원망이 드는 것이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어머니 이 음식 지금 버릴까요, 냉장고에 넣었다가 버릴까요.” 음식을 둘러싼 세대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우스갯소리 같은 현실이다.
어른들은 ‘요샛것들이 음식 귀한 줄 모른다.’고 하시고 젊은 축들은 ‘기성세대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궁상스러움’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음식을 귀히 여기는 마음은 당연히 대물림해야 하지만 자신의 몸속을 잔반처리통쯤으로 여기는 정서는 단절되어야 한다. 이 둘의 절충점은 어디일까.
여든을 넘긴 나이에도 정정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은퇴 여교수 한 분은 늘 이런 말을 하신다.“음식을 남겨서 미안해요. 그렇지만 내 몸의 환경문제도 중요해서요.”
여성들을 흔히 환경문제 해결의 주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쓰레기 청소의 주책임자라는 수준의 것이었다. 여성의 진정한 환경 주체성은 바로 자기 몸의 환경문제부터 관심 갖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오한숙희 여성학자
내 친구 중의 하나는 그 말이 듣기 싫어 결혼을 했더니 시어머니는 그 보다 한술 더 떠서 ‘이거 마저 쓸어 먹어라.’하더라며 피할 수 없는 여자의 잔반처리 인생을 한탄했었다.
우리 세대는 딸들에게 절대로 ‘먹어 치우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으려는 노력도 있지만 다이어트 열풍 속에 사는 요즘의 딸들에게는 그런 말이야말로 여드레 삶은 호박에 이도 안 들어갈 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일매일 밥상에서는 뒀다먹기도 그렇고 버리기엔 양심에 걸리는 애매한 반찬들이 필연적으로 생겨나니 그 앞에서 갈등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기 입에 털어넣는 것으로 갈등을 무마해 버리는 일이 주부들 사이에서는 비일비재하다.
오늘 아침 우리집 밥상에서도 그런 풍경이 벌어졌다.“얘, 요거 한 숟가락이 안 들어가서 남겼냐?” 음식 버리면 당장 하늘에서 마른 벼락이 떨어지는 줄 아시는 70대의 우리 어머니.“할머니 진짜 못 먹겠어요, 그거 마저 먹으면 속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완강하게 잔반처리를 거부하는 10대의 딸아이.
“어머니, 남겨 두세요. 나중에 먹게 하지요 뭐.” 중재에 나서는 40대의 나.“고거 한 숟갈 나중에 먹게 안 된다. 이리 다오.” 마침내 50년 이상 익숙해온 바대로 잔반처리를 자임하는 우리 어머니.“아, 할머니, 제가 나중에 먹을 게요.” 그릇을 들어 올려 할머니의 손길을 피하며 애원하는 딸아이. 이쯤되면 해결책은 하나뿐이다.“이러면 다 됐죠?” 한숟갈 남은 음식을 내 입에 털어 넣으며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상황은 종료되었다.
딸아이에게서는 고마워하는 시선을, 어머니에서는 어쩌냐고 걱정하는 눈길을 받는 내 기분은 샌드위치 심정이었지만 어쩐지 어머니에게로 섭섭함의 저울이 기우는 것은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만고의 진리를 거스르지 못해서만이 아니다.
며칠전에도 어머니는 잔반처리 과식으로 속탈이 나셨고 더 전에는 맛이 가기 직전의 음식을 드시고 고생하신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어머니의 잔반처리 욕구는 소식으로 건강을 관리해야 할 중년의 나로 하여금 술상무를 닮은 잔반상무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는 원망이 드는 것이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어머니 이 음식 지금 버릴까요, 냉장고에 넣었다가 버릴까요.” 음식을 둘러싼 세대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우스갯소리 같은 현실이다.
어른들은 ‘요샛것들이 음식 귀한 줄 모른다.’고 하시고 젊은 축들은 ‘기성세대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궁상스러움’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음식을 귀히 여기는 마음은 당연히 대물림해야 하지만 자신의 몸속을 잔반처리통쯤으로 여기는 정서는 단절되어야 한다. 이 둘의 절충점은 어디일까.
여든을 넘긴 나이에도 정정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은퇴 여교수 한 분은 늘 이런 말을 하신다.“음식을 남겨서 미안해요. 그렇지만 내 몸의 환경문제도 중요해서요.”
여성들을 흔히 환경문제 해결의 주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쓰레기 청소의 주책임자라는 수준의 것이었다. 여성의 진정한 환경 주체성은 바로 자기 몸의 환경문제부터 관심 갖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오한숙희 여성학자
2004-11-1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