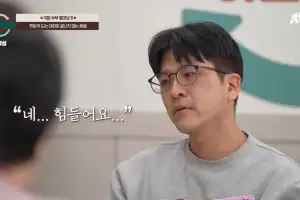경희대가 캠퍼스 명칭 변경을 놓고 심각한 교내 갈등을 빚고 있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이름에 대해 최종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가 절차상 문제를 들어 제동을 걸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이름을 바꾸는 과정에서 모든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변경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지금 진행되는 절차는 동의가 아니라 단지 이해를 구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학교는 지난해 9월부터 매월 학교, 학생, 교수, 동문 등의 대표가 참여하는 부총장 주재 캠퍼스 명칭 변경회의를 열어 왔다.
대표자들은 지난달 1일 회의에서 서울은 ‘인문·사회·의학 캠퍼스’로, 수원은 ‘국제·공학 캠퍼스’로 바꾸기로 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가 동의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학생측의 통일된 의견은 나오기 힘들게 됐다.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는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서울 총학생회가 왜 이제 와서 뒤집으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수원 캠퍼스는 설문조사와 단과대 대표가 모인 중앙위원회 회의까지 끝냈는데 서울 캠퍼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경희대에서 캠퍼스 명칭이 문제된 것은 2003년부터다. 수원캠퍼스에 2000년 입학한 학생들이 “경희대에는 분교가 없다는 모집책자 문구를 믿고 입학했지만 실제로는 분교로 취급돼 취업과정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본교 추진위원회’가 꾸려졌고 이후 명칭 변경은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의 핵심과제가 됐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6-07-0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