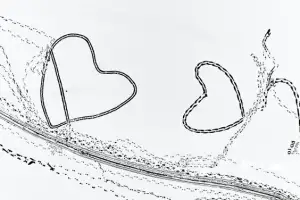선수 면면을 보면 역대 최고로 손색이 없었다. 우승은 힘들더라도 3위까지 주어지는 내년 터키 세계선수권 티켓은 가능할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가 드리웠다.
하지만 지금 농구계는 흉가 분위기다. 레바논(24위)에 패해 4강 탈락한 것은 물론 타이완(44위)에 져 7~8위전으로 밀려난 것. 16일 필리핀에 82-80으로 이겨 간신히 7위에 올랐다. 1960년 1회 대회 이후 한국 남자농구가 4강에 오르지 못한 것은 처음이다. 12년 만의 세계선수권 출전은커녕 최악의 성적을 남긴 것.
1년 전만 해도 희망은 있었다. 2007년 베이징올림픽 최종예선에서 김남기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강호 슬로베니아(20위), 캐나다(19위)와 접전 끝에 패했다. 당시 대표팀은 김주성(동부)과 주희정(SK)을 빼면 ‘유니버시아드(대학선발)급’. 하지만 외곽에 의존하는 ‘양궁농구’를 버리고 조직력에 승부를 걸었다. 확률 높은 인사이드 공격 패턴이 늘면서 덩달아 3점슛 성공률도 52.2%로 치솟았다.
왜 퇴보한 것일까. 대표팀 관리부터 주먹구구였다. 한국농구연맹(KBL)과 대한농구협회(KBA)의 알력으로 사령탑 선임부터 순조롭지 않았다. 틀을 잡아가던 전임감독 체제는 일찌감치 뭉개졌다.
악전고투의 시즌을 치른 허재(KCC) 감독에게 지휘봉이 맡겨졌다. 기본으로 여겨지는 상대팀 전력분석이나 평가전도 없었다. 윌리엄존스컵 출전이 전부. 합숙은 용인 KCC체육관에서, 트레이너와 주무도 KCC 프런트가 맡았다. KBA와 KBL은 뒷짐만 지었다. 색깔 없는 농구와 전술 부재도 뼈아팠다. 골밑의 하승진이 제몫을 못하고, 외곽슈터 방성윤·이규섭이 슬럼프에 빠지자 대책 없이 무너졌다.
이란과 요르단, 레바논 등이 중국을 넘볼 만큼 성장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만 ‘아시아 2인자’란 착각에 빠져 있었다. 결국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1960~70년대 우승을 나눠 가졌던 일본과 필리핀이 몰락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