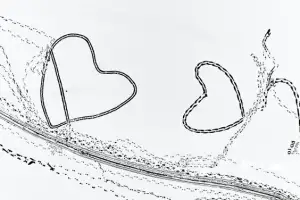입학사정관제 사례 세미나서 참석자들 토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뽑아야 할지….”
최근 몇년 동안 입학사정관제를 시범 운영해 온 각 학교들이 직접 사례를 소개했지만 참석자들의 표정이 밝지만 않았다.
이날 세미나는 2010년 입시부터 입학사정관 전형이 대폭 확대되는 것에 대비해 운영 사례 및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전국 각 대학 입학사정관 350여명과 입학처장 등 관계자들이 몰려 들었다.
먼저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했던 20여개 대학이 지난해 사례를 발표했다. 한동대는 대안학교 전형으로 발굴한 학생을 소개했다.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이었다. 성적은 수학 2~3등급, 영어 4~5등급, 국어 4~5등급으로 좋은 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적극적인 자세가 돋보였다. 방학 때는 보청기 제조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난청 아동캠프 보조요원, 난청인 클라리넷 앙상블 단원으로도 활동했다.
동국대는 수험생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해 합격한 사례를 소개했다.
국어국문학과에 합격한 A군의 경우 판타지 소설을 15권이 썼다. 물리학과에 합격한 B군은 연구실험 활동에 흥미를 느껴 각종 연구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연구 보고서도 여러편 작성했다. 영화영상학과에 합격한 C군은 국제 청소년 영화제에서 비평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시나리오를 직접 쓰기도 했다.
사례 발표는 계속됐지만 참석자들은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들이었다. 질문도 쏟아졌다. 한 참석자는 “고교별 특성을 반영하라는데 현실적으로 특목고, 자사고 말고 특성화된 고교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고교 특성을 반영한다는 것은 주관적이고 어려운 일이다.”고 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입학처장도 “포스텍은 선발인원이 얼마 안돼 전국 고교를 돌아다닐 수 있지만 학생수가 많은 대학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제주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9-03-2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