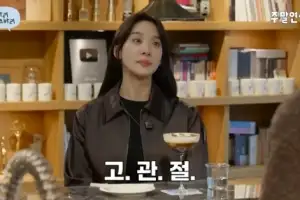“일정 기간이 지나면 작품집을 묶어내다 보니 마치 내 자신이 물레방아가 된 느낌입니다. 이번 작품집을 묶기에 한편이 모자라 한편을 더 쓰고 있는데, 병원에서 부르는 바람에…, 허허. 중단했다가 마무리짓게 돼 기분이 홀가분합니다.”
신작 ‘그곳을 다시 잊어야 했다’(열림원)를 펴낸 소설가 이청준(68)씨가 27일 기자들과 만났다. 창작생활 42년 결산의 의미도 담고 있는 이 작품집엔 표제작 ‘그곳을 다시 잊어야 했다’ 등 중편 3편,‘지하실’등 단편 4편,‘귀항지 없는 항로’등 에세이소설 4편이 실렸다.
작품집은 다양한 형식과 분량만큼이나 작가가 복원하고 추구해온 폭넓은 세계를 담고 있다. 형식에 얽매이는 출판기념회가 싫다는 작가는 이런 가치관 때문인지 숱한 작품집을 내면서도 책머리에 서문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이 소설집에는 서문을 썼다. 이유에 대해 “처음부터 서문을 쓰지 않다 보니 계속 쓰지 않게 됐다.”며 “이번에는 그동안 많은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의 표시로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문단생활 중 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역사소설을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다산 정약용과 추사 김정희, 초의선사, 소치 허유가 만나 다회(茶會)를 여는 모습을 그려보고 싶었는데….‘목민심서’등 다산 책을 읽어 보니 이 소설을 쓰게 위해서는 가톨릭과 유·불·선 등 사상체계가 너무나 광범위해 쓸 엄두가 나지 않아 그만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부터 드려요. 될 수 있는 대로 기분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하루 일과를 털어놓은 그는 “앞으로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모임을 끝냈다.
김규환기자 khkim@seoul.co.kr
2007-11-28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