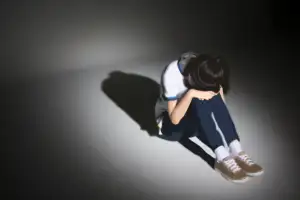TV나 영화의 사극에 보면 왕이나 문무백관 등이 입은 예복 뒤에 달아 늘여진 장식을 볼 수 있다. 바로 ‘후수’(後綬·작은 사진)라는 천 장식물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까지 황제나 왕 이하 문무백관들이 면복, 조복, 제복에 패용하던 것이다. 극중에선 인물의 앞부분이 부각되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그 색깔과 문양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마련이다.
남아 있는 유물이 거의 없고 관련 문헌도 빈약해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주먹구구로 만들어 사용해 오다가 90년대 이후 제대로 복원된 후수가 선을 보이기 시작했다. 바로 장순례(69)씨가 나서면서부터다. 국내 유일의 후수 복원 전문가인 그는 요즘 서울 남산골한옥마을 공예전시관에서 국내 첫 후수전시회를 갖고 있다.
“후수는 매듭과 망수(網綬), 자수가 어우러진 한국 전통미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시간과 돈,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섣불리 뛰어들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80년대 중반부터 퍼즐 맞추듯 복원
원래 70년대 이후 매듭에 매료돼 국내외 전시를 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았던 그가 후수에 눈을 돌린 것은 80년대 중반부터다. 숙련된 기능인을 넘어 창조성을 추구하는 예술가로 거듭나고자 한 것이다. 한국 복식사 분야의 권위자인 유희경 당시 이화여대 교수가 후수 복원에 나서볼 것을 권유한 게 계기가 됐다.
하지만 문헌에 단편적인 기록이 전해질 뿐 유물조차 없는 후수 복원에 나서니 마치 망망대해에서 노도 없이 쪽배에 탄 기분이었다고 한다.
“‘국조오례의’와 ‘대한예전’ 등 조선시대 문헌은 물론 중국 문헌까지 참조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후수에 대해선 단편적으로 몇 글자, 혹은 몇 줄 언급하고 있을 뿐이어서 마치 퍼즐을 맞추듯 여러 군데에서 정보를 취합해 작업해야 했어요.”
무수한 시행착오가 거듭됐다. 실의 염색과 선택, 색깔 배열, 매듭의 두께, 가닥 수 결정 등 하나하나의 단계마다 고민이 거듭됐고, 그때마다 문헌과 관련 전문가들을 찾아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후수 작업은 인내의 실험… 비용도 만만찮아
“후수 작업은 인내의 실험과도 같다.”는 장씨. 가느다란 명주 색실로 매듭을 지어 후수 바탕을 만드는 데 두어 달, 그 위에 수를 놓고 망수와 패옥 등을 다는 데 두어 달 걸리니, 그림·종이 시제품 작업까지 하면 웬만한 후수 하나 만드는 데 족히 6개월은 걸리는 셈이다. 명주실이나 귀금속 구입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돈 벌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시작조차 못했을 것이라고 한다. 비교적 여유 있는 집안의 가정주부로 경제적 제약 없이 가족들의 이해가 뒷받침된 것이 큰 힘이 됐단다.
장씨는 후수에 몰입한 지 5년 만에 왕과 왕비의 후수 복원에 성공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황제와 문무백관 등의 예복에 달던 후수 20여개를 재현했다.
이 과정에서 시대에 따른 후수의 변화상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다. 고려 공민왕 때 처음으로 패용됐던 후수는 조선 중기에 그 폭이 커졌다가 이후 다시 작아지는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도 밝혀냈고, 후수 윗부분에 다는 환(環) 장식물 재료로 황제나 임금은 옥을, 문무백관은 금이나 은 도금된 것을 쓴다는 것도 알아냈다.
●후수 전승 위해 전문서 낼 계획
하지만 기록의 한계 때문에 일부 표현은 작가의 고유 몫이 됐다. 특히 단일한 훈색 바탕에 황(黃)·백(白)·현(玄)·표()·녹(綠)의 소수(小綬)를 늘어뜨려 중후하면서도 세련된 멋을 낸 것은 작가 특유의 예술세계를 돋보이게 하는 부분이다.
지금도 복식 유물전이나 혹은 유물 출토 소식을 들으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간다는 장씨. 혹시라도 후수 복원의 또 다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다. 그리고 더 이상 나이 들기 전에 꼭 해야 할 한 가지 일을 준비 중이다. 바로 후수 전승을 위한 것.
“지금까지의 연구와 복원작업을 집대성한 후수 전문서를 내고 싶어요. 그래야 나중에 제가 없어도 더 이상 시행착오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남아 있는 유물이 거의 없고 관련 문헌도 빈약해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주먹구구로 만들어 사용해 오다가 90년대 이후 제대로 복원된 후수가 선을 보이기 시작했다. 바로 장순례(69)씨가 나서면서부터다. 국내 유일의 후수 복원 전문가인 그는 요즘 서울 남산골한옥마을 공예전시관에서 국내 첫 후수전시회를 갖고 있다.
“후수는 매듭과 망수(網綬), 자수가 어우러진 한국 전통미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시간과 돈,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섣불리 뛰어들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80년대 중반부터 퍼즐 맞추듯 복원
원래 70년대 이후 매듭에 매료돼 국내외 전시를 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았던 그가 후수에 눈을 돌린 것은 80년대 중반부터다. 숙련된 기능인을 넘어 창조성을 추구하는 예술가로 거듭나고자 한 것이다. 한국 복식사 분야의 권위자인 유희경 당시 이화여대 교수가 후수 복원에 나서볼 것을 권유한 게 계기가 됐다.
하지만 문헌에 단편적인 기록이 전해질 뿐 유물조차 없는 후수 복원에 나서니 마치 망망대해에서 노도 없이 쪽배에 탄 기분이었다고 한다.
“‘국조오례의’와 ‘대한예전’ 등 조선시대 문헌은 물론 중국 문헌까지 참조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후수에 대해선 단편적으로 몇 글자, 혹은 몇 줄 언급하고 있을 뿐이어서 마치 퍼즐을 맞추듯 여러 군데에서 정보를 취합해 작업해야 했어요.”
무수한 시행착오가 거듭됐다. 실의 염색과 선택, 색깔 배열, 매듭의 두께, 가닥 수 결정 등 하나하나의 단계마다 고민이 거듭됐고, 그때마다 문헌과 관련 전문가들을 찾아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후수 작업은 인내의 실험… 비용도 만만찮아
“후수 작업은 인내의 실험과도 같다.”는 장씨. 가느다란 명주 색실로 매듭을 지어 후수 바탕을 만드는 데 두어 달, 그 위에 수를 놓고 망수와 패옥 등을 다는 데 두어 달 걸리니, 그림·종이 시제품 작업까지 하면 웬만한 후수 하나 만드는 데 족히 6개월은 걸리는 셈이다. 명주실이나 귀금속 구입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돈 벌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시작조차 못했을 것이라고 한다. 비교적 여유 있는 집안의 가정주부로 경제적 제약 없이 가족들의 이해가 뒷받침된 것이 큰 힘이 됐단다.
장씨는 후수에 몰입한 지 5년 만에 왕과 왕비의 후수 복원에 성공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황제와 문무백관 등의 예복에 달던 후수 20여개를 재현했다.
이 과정에서 시대에 따른 후수의 변화상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다. 고려 공민왕 때 처음으로 패용됐던 후수는 조선 중기에 그 폭이 커졌다가 이후 다시 작아지는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도 밝혀냈고, 후수 윗부분에 다는 환(環) 장식물 재료로 황제나 임금은 옥을, 문무백관은 금이나 은 도금된 것을 쓴다는 것도 알아냈다.
●후수 전승 위해 전문서 낼 계획
하지만 기록의 한계 때문에 일부 표현은 작가의 고유 몫이 됐다. 특히 단일한 훈색 바탕에 황(黃)·백(白)·현(玄)·표()·녹(綠)의 소수(小綬)를 늘어뜨려 중후하면서도 세련된 멋을 낸 것은 작가 특유의 예술세계를 돋보이게 하는 부분이다.
지금도 복식 유물전이나 혹은 유물 출토 소식을 들으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간다는 장씨. 혹시라도 후수 복원의 또 다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다. 그리고 더 이상 나이 들기 전에 꼭 해야 할 한 가지 일을 준비 중이다. 바로 후수 전승을 위한 것.
“지금까지의 연구와 복원작업을 집대성한 후수 전문서를 내고 싶어요. 그래야 나중에 제가 없어도 더 이상 시행착오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6-08-11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