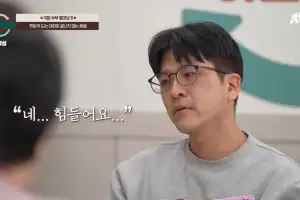청와대가 어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거국내각을 구성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여야가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국내각 구성을 요청한다면 이를 각 당과 협의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을 빌렸으나 청와대 스스로 밝혔듯 충분한 사전검토가 뒷받침된 입장 표명으로 보인다. 여권의 정계개편 논란에 거국내각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셈이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거국내각 구성의 필요성으로 주요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꼽았다.“지난 1년간 사학법 문제로 주요 국정과제가 미뤄져 온 만큼 거국내각을 구성해서라도 이를 타개하자는 생각”이라는 것이다. 사학법 대치와 관련한 청와대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여권이 정계개편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돌출한 청와대의 거국내각 카드는 여러모로 석연치가 않다. 거국내각을 정계개편의 지렛대로 삼으려 한다는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과 거국내각 구성이 정계개편의 한 시나리오로 일찌감치 여권 안에서 거론돼 온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지난 시절 우리는 숱한 중립내각을 봐 왔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모두 임기 후반 탈당과 함께 중립내각을 구성했다. 그때마다 성공적인 국정 마무리와 공정한 대선관리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실상은 권력 다툼의 결과였거나 떠난 민심을 붙들려는 자구책이었을 뿐이다.
참여정부의 임기가 1년 3개월이나 남아 있고, 대통령이 건재한 마당에 거국내각 구성은 타당하지 않다. 대통령제 기본원칙에 어긋날 뿐더러 참여정부를 선택한 민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반대한 이상 실현 가능성도 없다. 청와대는 거국내각 문제로 정계개편 논란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차분히 국정을 마무리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2006-11-1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