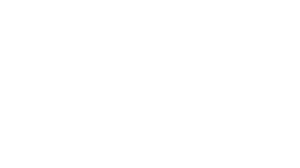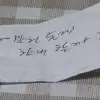청와대는 최근 양극화 시리즈를 통해 빈부격차 등 양극화 심화의 원인을 박정희식 ‘압축성장’의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서구 자본주의의 100년 역사를 20년으로 단축하려다 보니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전략을 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불균형과 속도 경제의 모순은 IMF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불러들인 것으로 분석했다. 빈곤 탈출이 지상과제였던 1960,70년대에는 템포 빠른 군가풍의 노래가 유행했다. 대중가수들이 취입한 음반 마지막 부분에 ‘건전가요 보급’이라는 명목으로 군가가 의무적으로 삽입되던 시절이었다. 우리의 ‘빨리 빨리’문화는 그 시절 국민들이 무의식중에 장단을 맞춘 빠른 곡조와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1990년 중반 이후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과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 땅에 몰려오면서 가장 먼저 듣고 익히게 되는 단어가 ‘빨리 빨리’였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파견할 연수생들을 교육하면서 군대식 체력훈련 외에 선착순 뺑뺑이를 돌리는 것도 우리의 속도 중시문화에 미리 적응시키려는 의도로 이해된다. 오죽했으면 한국에 유학 오는 외국 학생이 한결같이 듣게 되는 조언이 한국인과 식사 속도를 맞추려다가는 굶기 십상이라며 함께 식사하지 말라는 것이었을까. 몇해 전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느림’ 열풍은 ‘빨리 빨리’문화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일상 풍경인 카페는 ‘비스트로’라고도 불린다. 그 어원은 1815년 나폴레옹이 몰락한 뒤 파리에 입성한 러시아 군인들이 카페로 몰려와 ‘빨리 빨리’ 마실 것을 달라며 ‘비스트로 비스트로’라고 외친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파리지앵의 느긋한 생활상을 상징하는 카페에 이처럼 정반대의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유럽에 진출한 한국의 전자업체들이 ‘빨리 빨리 서비스’로 현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자제품이 고장나면 유통업체로 들고가 맡긴 뒤 한달 이상 기다려야 했던 소비자들로서는 집으로 방문해 즉시 수리해주니 혹할 수밖에 없으리라. 국내에서는 구박받는 ‘빨리 빨리’가 머잖아 유럽에서는 서비스 혁명을 선도하는 유행어로 자리잡을지도 모르겠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그래서 1990년 중반 이후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과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 땅에 몰려오면서 가장 먼저 듣고 익히게 되는 단어가 ‘빨리 빨리’였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파견할 연수생들을 교육하면서 군대식 체력훈련 외에 선착순 뺑뺑이를 돌리는 것도 우리의 속도 중시문화에 미리 적응시키려는 의도로 이해된다. 오죽했으면 한국에 유학 오는 외국 학생이 한결같이 듣게 되는 조언이 한국인과 식사 속도를 맞추려다가는 굶기 십상이라며 함께 식사하지 말라는 것이었을까. 몇해 전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느림’ 열풍은 ‘빨리 빨리’문화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일상 풍경인 카페는 ‘비스트로’라고도 불린다. 그 어원은 1815년 나폴레옹이 몰락한 뒤 파리에 입성한 러시아 군인들이 카페로 몰려와 ‘빨리 빨리’ 마실 것을 달라며 ‘비스트로 비스트로’라고 외친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파리지앵의 느긋한 생활상을 상징하는 카페에 이처럼 정반대의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유럽에 진출한 한국의 전자업체들이 ‘빨리 빨리 서비스’로 현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자제품이 고장나면 유통업체로 들고가 맡긴 뒤 한달 이상 기다려야 했던 소비자들로서는 집으로 방문해 즉시 수리해주니 혹할 수밖에 없으리라. 국내에서는 구박받는 ‘빨리 빨리’가 머잖아 유럽에서는 서비스 혁명을 선도하는 유행어로 자리잡을지도 모르겠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2006-03-2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