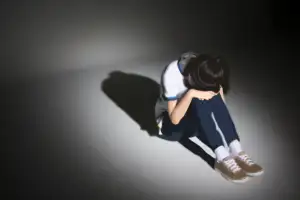1987년 민주화는 대통령직선제를 목표로 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에서 다당제 선거·대통령직선제를 민주주의의 골자로 내세우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1972년 유신이후 1987년까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대통령제에서 그 선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한다는 것은 ‘인민의 통치’라는 민주주의의 제1원칙에 위반되는 것이었다. 특정 정당이나 국가기관이 주권을 좌지우지하는 위임정부 치고 성공 사례가 없다는 점도 주권재민의 가치를 높여 주었다. 여기에는 김영삼·김대중으로 상징되는 1970년대 야당 지도자들 모두가 가시적으로 대통령 당선권에 들어가 있었던 것도 ‘민주화=대통령 직선제’로 정식화하는 데 유용했다.
민주주의에서 누구나 경의해 마지않는 선거도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기본적으로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기고 지는 게 모든 것을 얻거나 잃도록 되어 있는 한, 선거는 제로섬 게임의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임하는 당사자들은 서로 죽기 살기의 대립과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며, 급기야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는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이렇게 선거가 전쟁의 특성을 보이는 한, 불법 선거과정에 대한 통제는 엄격한 처벌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전쟁이 아닌 상생과 나눔의 평화 철학에 기초하여 선거를 치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 대통령제에서 선거의 전쟁적 특성을 조금이나마 회피하기 위해서 부통령제를 도입해서 2위에게 그 직책을 주면 어떨까. 그러면 선거에서 서로 대통령이 되려고 열심히 뛰겠지만, 많은 경우 큰 표 차이 없이 떨어진 2등도 부통령으로서 또는 부통령을 당선시킨 제2당으로서 책임과 부담을 갖고 국정에 협조자로 나서지 않을까.
물론 여기에는 책임정당제 차원에서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1당과 2당이 서로 협조하면서 국정에 임할 경우 무엇이 잘못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인데, 결국 최종 책임은 대통령과 제1당이 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각책임제가 아닌 대통령책임제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통령제와 중대선거구 국회의원제를 통해 승자독식이 아닌 2·3위에게도 기회를 준다면, 지금과 같은 선거에서의 전쟁 상태는 줄어들고 그 대신 이른바 상생의 정치 내지는 나눔의 정치로 변모해 나가지 않을까.
1980년 ‘서울의 봄’시대의 안개정국과 1987년 민주화 바로 직전의 개헌공방 정국에서 권력구조와 선거구제를 둘러싸고 백가쟁명이 있었다.
당시의 다양한 개헌 논의는 집권 군부나 여당의 권력 재창출 내지는 집권 연장을 위한 획책으로 거부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제 21세기로 세상이 많이 변했다. 이제는 대통령 책임과 여대(與大)국회를 중시하는 정당책임의 단일적 시각에서 정당과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복수의 시각으로, 그리고 궁극으로는 다양한 정치세력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적 다양성의 공존으로 옮겨 갈 때가 되었다.
이제는 대통령 단임제를 그만하고 중임제를 할 때가 되었고, 대통령의 권한도 대통령·부통령으로의 권력 공유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국회도 단원제만이 아닌 양원제로 확대하여 단일 의회만능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하는가 하면, 지방도 선출된 도지사나 시장의 단독 책임에서 2등으로 선출된 부지사나 부시장과 함께 4년의 풀뿌리 민생을 책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독 책임에서 벗어나 복수의 공동 책임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놓고 선거를 치르게 되면, 비로소 정치는 제로섬게임만이 아닌 상생과 나눔의 정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양길현 제주대 정치학 교수
대통령제에서 그 선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한다는 것은 ‘인민의 통치’라는 민주주의의 제1원칙에 위반되는 것이었다. 특정 정당이나 국가기관이 주권을 좌지우지하는 위임정부 치고 성공 사례가 없다는 점도 주권재민의 가치를 높여 주었다. 여기에는 김영삼·김대중으로 상징되는 1970년대 야당 지도자들 모두가 가시적으로 대통령 당선권에 들어가 있었던 것도 ‘민주화=대통령 직선제’로 정식화하는 데 유용했다.
민주주의에서 누구나 경의해 마지않는 선거도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기본적으로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기고 지는 게 모든 것을 얻거나 잃도록 되어 있는 한, 선거는 제로섬 게임의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임하는 당사자들은 서로 죽기 살기의 대립과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며, 급기야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는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이렇게 선거가 전쟁의 특성을 보이는 한, 불법 선거과정에 대한 통제는 엄격한 처벌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전쟁이 아닌 상생과 나눔의 평화 철학에 기초하여 선거를 치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 대통령제에서 선거의 전쟁적 특성을 조금이나마 회피하기 위해서 부통령제를 도입해서 2위에게 그 직책을 주면 어떨까. 그러면 선거에서 서로 대통령이 되려고 열심히 뛰겠지만, 많은 경우 큰 표 차이 없이 떨어진 2등도 부통령으로서 또는 부통령을 당선시킨 제2당으로서 책임과 부담을 갖고 국정에 협조자로 나서지 않을까.
물론 여기에는 책임정당제 차원에서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1당과 2당이 서로 협조하면서 국정에 임할 경우 무엇이 잘못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인데, 결국 최종 책임은 대통령과 제1당이 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각책임제가 아닌 대통령책임제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통령제와 중대선거구 국회의원제를 통해 승자독식이 아닌 2·3위에게도 기회를 준다면, 지금과 같은 선거에서의 전쟁 상태는 줄어들고 그 대신 이른바 상생의 정치 내지는 나눔의 정치로 변모해 나가지 않을까.
1980년 ‘서울의 봄’시대의 안개정국과 1987년 민주화 바로 직전의 개헌공방 정국에서 권력구조와 선거구제를 둘러싸고 백가쟁명이 있었다.
당시의 다양한 개헌 논의는 집권 군부나 여당의 권력 재창출 내지는 집권 연장을 위한 획책으로 거부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제 21세기로 세상이 많이 변했다. 이제는 대통령 책임과 여대(與大)국회를 중시하는 정당책임의 단일적 시각에서 정당과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복수의 시각으로, 그리고 궁극으로는 다양한 정치세력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적 다양성의 공존으로 옮겨 갈 때가 되었다.
이제는 대통령 단임제를 그만하고 중임제를 할 때가 되었고, 대통령의 권한도 대통령·부통령으로의 권력 공유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국회도 단원제만이 아닌 양원제로 확대하여 단일 의회만능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하는가 하면, 지방도 선출된 도지사나 시장의 단독 책임에서 2등으로 선출된 부지사나 부시장과 함께 4년의 풀뿌리 민생을 책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독 책임에서 벗어나 복수의 공동 책임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놓고 선거를 치르게 되면, 비로소 정치는 제로섬게임만이 아닌 상생과 나눔의 정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양길현 제주대 정치학 교수
2005-04-1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