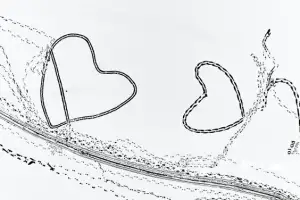언젠가 신문에서 읽은 얘기다. 국내 한 대학의 이사장님께서 같은 대학 미대 교수가 제작한 모자상(母子像)이 너무 뚱뚱하다며 조각상을 팔등신의 늘씬한 미인으로 바꾸어 제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런 지시를 받은 교수는 예술가로서의 양심에 따라 당연히 그것을 거부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 교수는 재임용에서 탈락되는 수모를 겪었다고 한다.
수십 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소위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 대망의 21세기에 일어난 일이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다. 이때 내가 놀랐던 것은 그 사학재단이 저지른 엄청난 비리가 아니었다. 사실 이런 종류의 비리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놀랄 만한 일도 되지 못한다. 내가 정작 놀랐던 것은 권력을 쥔 사람이 아주 비상식적인 이유로 예술작품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내렸다는 것과, 예술가가 그것을 거부한 것에 대해 괘씸죄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모차르트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아마데우스’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오페라 ‘후궁으로부터의 도주’의 초연이 끝난 후, 공연을 본 오스트리아의 요제프 황제가 신하들을 대동하고 모차르트를 찾았다.
그는 일단 작품이 매우 훌륭했다고 칭찬을 한다. 하지만 너무 칭찬만 해서는 황제로서의 권위가 서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
이 말에 수긍할 수 없었던 모차르트가 무엇이 부족하냐고 묻자 황제는 당황한다. 꼬투리를 잡을 말이 영 떠오르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눈치 빠른 신하가 “음표가 너무 많아.”라고 하자 마침 이제야 생각났다는 듯이 “맞아. 음표가 너무 많아.”라고 말한다.
모차르트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꼭 필요한 음만 썼다고 하자 황제는 “그래도 한가한 저녁에 듣기에는 음표가 너무 많아. 음표를 줄이도록 하지.” 이렇게 얘기하고는 자리를 뜬다.
실제로 요제프 황제가 이런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아마데우스’의 작가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통해 예술에 대해 식견이 없는 권력자와 그 밑에서 일하는 예술가 사이에 있음직한 갈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다.
음표를 줄이라는 지시를 받고 모차르트가 얼마나 황당했을까. 속된 말로 얼마나 분통이 터졌을까.
그가 교회와 귀족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생의 마지막 10년을 프리랜서로 보냈던 것도 어쩌면 이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경제적 안정을 버리는 대신 예술가로서의 자유를 얻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도 참담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와 그 밑에서 일하는 예술가. 역사를 살펴보면 양 쪽이 서로 행복하게 만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경우,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는 쪽은 예술가이다.
왜냐하면 예술작품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지시를 내리는 쪽은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인지 스스로 모르기 때문이다. 하기야 그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면 애초부터 음표를 줄이라는 식의 몰상식한 주문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얼마 전에 예술가에게 엄청나게 많은 후원을 하고 있는 미국의 한 억만장자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그는 후원하지만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후원을 받은 예술가가 몇 년 동안 작품 하나 발표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것이다.
예술가가 그저 놀기만 해도 그것은 새로운 작품을 위한 충전이라고 생각하며, 자기가 준 돈으로 술을 먹든 여행을 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국 그것을 통해 얻은 경험이 나중에 빛나는 예술작품으로 탄생할 것이라고 믿어주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아무에게나 가능한 일은 아니다.
예술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술가의 자유와 창작의지를 존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회숙 음악칼럼니스트
이런 지시를 받은 교수는 예술가로서의 양심에 따라 당연히 그것을 거부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 교수는 재임용에서 탈락되는 수모를 겪었다고 한다.
수십 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소위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 대망의 21세기에 일어난 일이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다. 이때 내가 놀랐던 것은 그 사학재단이 저지른 엄청난 비리가 아니었다. 사실 이런 종류의 비리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놀랄 만한 일도 되지 못한다. 내가 정작 놀랐던 것은 권력을 쥔 사람이 아주 비상식적인 이유로 예술작품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내렸다는 것과, 예술가가 그것을 거부한 것에 대해 괘씸죄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모차르트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아마데우스’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오페라 ‘후궁으로부터의 도주’의 초연이 끝난 후, 공연을 본 오스트리아의 요제프 황제가 신하들을 대동하고 모차르트를 찾았다.
그는 일단 작품이 매우 훌륭했다고 칭찬을 한다. 하지만 너무 칭찬만 해서는 황제로서의 권위가 서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
이 말에 수긍할 수 없었던 모차르트가 무엇이 부족하냐고 묻자 황제는 당황한다. 꼬투리를 잡을 말이 영 떠오르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눈치 빠른 신하가 “음표가 너무 많아.”라고 하자 마침 이제야 생각났다는 듯이 “맞아. 음표가 너무 많아.”라고 말한다.
모차르트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꼭 필요한 음만 썼다고 하자 황제는 “그래도 한가한 저녁에 듣기에는 음표가 너무 많아. 음표를 줄이도록 하지.” 이렇게 얘기하고는 자리를 뜬다.
실제로 요제프 황제가 이런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아마데우스’의 작가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통해 예술에 대해 식견이 없는 권력자와 그 밑에서 일하는 예술가 사이에 있음직한 갈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다.
음표를 줄이라는 지시를 받고 모차르트가 얼마나 황당했을까. 속된 말로 얼마나 분통이 터졌을까.
그가 교회와 귀족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생의 마지막 10년을 프리랜서로 보냈던 것도 어쩌면 이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경제적 안정을 버리는 대신 예술가로서의 자유를 얻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도 참담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와 그 밑에서 일하는 예술가. 역사를 살펴보면 양 쪽이 서로 행복하게 만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경우,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는 쪽은 예술가이다.
왜냐하면 예술작품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지시를 내리는 쪽은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인지 스스로 모르기 때문이다. 하기야 그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면 애초부터 음표를 줄이라는 식의 몰상식한 주문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얼마 전에 예술가에게 엄청나게 많은 후원을 하고 있는 미국의 한 억만장자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그는 후원하지만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후원을 받은 예술가가 몇 년 동안 작품 하나 발표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것이다.
예술가가 그저 놀기만 해도 그것은 새로운 작품을 위한 충전이라고 생각하며, 자기가 준 돈으로 술을 먹든 여행을 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국 그것을 통해 얻은 경험이 나중에 빛나는 예술작품으로 탄생할 것이라고 믿어주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아무에게나 가능한 일은 아니다.
예술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술가의 자유와 창작의지를 존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회숙 음악칼럼니스트
2005-03-1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