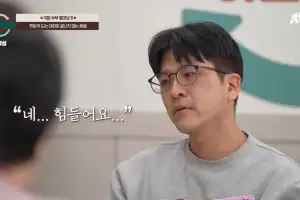영국 버킹엄궁 왕실 마굿간은 100여대에 이르는 왕실 마차 중 30여대를 관광객들에게 공개한다. 그중에도 가장 화려하고 오래된 마차는 1762년산 ‘황금마차’다. 이름처럼 차체 전체가 황금으로 도금된 마차는 무게가 4t이나 돼 말 8마리가 끌어야 움직인다. 조지 3세 국왕이 의회 개원식 때 처음 탄 이 마차는 1821년 조지4세 이래 모든 왕의 즉위식에 사용돼 권위 면에서도 최고 무게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영국 왕실의 마차들엔 일정한 용도가 있다.4마리 말이 끄는 1851년산 ‘아일랜드 마차’는 여왕의 의회 개원식 행차 때 사용되고 1881년산 ‘유리마차’는 왕실 결혼식용이다.‘퀸 빅토리아 상아장식 4륜마차’는 여왕이 생일축하 퍼레이드 때 타고 있다. 왕실 마차의 중요한 용도로 손님 접대를 빼놓을 수 없다.1988년 호주가 건국 200년 기념으로 여왕에게 선물한 ‘호주 마차’는 국빈 행사에 주로 사용된다.
집주인이 자신의 물건을 손님에게 내주는 것은 최상의 호의표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전통과 품격을 자랑하는 영국 왕실의 마차 체험이라면 받는 이의 감동은 남다를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주영 한국대사를 지낸 한 외교관의 신임장 제정 회고담은 들을 만하다. 영국 측이 의전으로 버킹엄궁까지 왕실 마차를 타고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더라는 것. 그는 “왕실마차가 그 어떤 자동차보다도 안락하게 느껴지더라.”며 “이 순간을 외교관 생애 중 가장 커다란 호사로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마차 안의 안락감은 차체의 안정성보다 상대방의 호의가 전달돼 왔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어제 아침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과 나란히 ‘호주 마차’를 타고 버킹엄궁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도되었다. 황금으로 장식된 마차 안에서 여왕의 환대를 받는 노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 영국 여왕의 국빈은 1년에 단 2명이라고 한다. 작년엔 러시아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올해는 폴란드 대통령 1명이 다녀갔을 뿐이다. 황금마차 사진 속에는 분명 세계 속의 한국 위상이 들어있다. 그러나 그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자부심과 함께 기대와 염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의 혼란을 씻고 사진처럼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신연숙 수석논설위원 yshin@seoul.co.kr
이처럼 영국 왕실의 마차들엔 일정한 용도가 있다.4마리 말이 끄는 1851년산 ‘아일랜드 마차’는 여왕의 의회 개원식 행차 때 사용되고 1881년산 ‘유리마차’는 왕실 결혼식용이다.‘퀸 빅토리아 상아장식 4륜마차’는 여왕이 생일축하 퍼레이드 때 타고 있다. 왕실 마차의 중요한 용도로 손님 접대를 빼놓을 수 없다.1988년 호주가 건국 200년 기념으로 여왕에게 선물한 ‘호주 마차’는 국빈 행사에 주로 사용된다.
집주인이 자신의 물건을 손님에게 내주는 것은 최상의 호의표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전통과 품격을 자랑하는 영국 왕실의 마차 체험이라면 받는 이의 감동은 남다를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주영 한국대사를 지낸 한 외교관의 신임장 제정 회고담은 들을 만하다. 영국 측이 의전으로 버킹엄궁까지 왕실 마차를 타고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더라는 것. 그는 “왕실마차가 그 어떤 자동차보다도 안락하게 느껴지더라.”며 “이 순간을 외교관 생애 중 가장 커다란 호사로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마차 안의 안락감은 차체의 안정성보다 상대방의 호의가 전달돼 왔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어제 아침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과 나란히 ‘호주 마차’를 타고 버킹엄궁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도되었다. 황금으로 장식된 마차 안에서 여왕의 환대를 받는 노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 영국 여왕의 국빈은 1년에 단 2명이라고 한다. 작년엔 러시아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올해는 폴란드 대통령 1명이 다녀갔을 뿐이다. 황금마차 사진 속에는 분명 세계 속의 한국 위상이 들어있다. 그러나 그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자부심과 함께 기대와 염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의 혼란을 씻고 사진처럼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신연숙 수석논설위원 yshin@seoul.co.kr
2004-12-03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