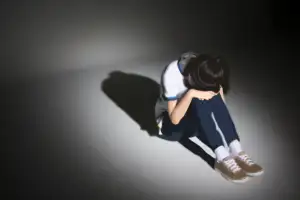# 장면2 4일 밤 한국과 호주의 8강전이 열린 자카르타의 이스토라 경기장에선 풀세트 접전이 이어졌다.
호주 감독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이어폰을 낀 채 선수들을 지휘했다.
경기장 곳곳에 포진한 3명의 경기분석관으로부터 실시간 경기 내용 분석을 보고받고, 그때 그때 필요한 작전을 구사했다. 한국팀에는 경기분석관이란 스태프 자체가 없다. 한국은 2-3으로 역전패했다.
# 장면3 하루 뒤인 5일 오후 같은 경기장에서 열린 한국-일본전. 경기장 한쪽을 가득 메운 일본 팬들은 자국 선수들이 득점할 때마다 국기를 흔들며 환호했다.
반면 한국이 득점할 땐, 경기장 한쪽에 자리한 교민 일가족 4명이 목청껏 ‘대∼한민국’을 외쳤지만 일본인들의 응원 소리에 묻혀버렸다. 한국은 일본에 1-3으로 무릎을 꿇었다.
옛말에 뿌린 만큼 거둔다고 했다.1년 내내 크고 작은 경기에 참가해 지칠 대로 지친 선수들, 경기분석관은 물론 물리치료사조차 없는 빈약한 스태프, 열악한 예산에 허덕이는 배구협회, 큰 경기가 아니면 관심도 없는 팬들…. 이 모든 것이 이번 대회에서 드러난 남자배구의 현주소였다. 그런 여건에서도 대표팀은 호주와 일본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축구·야구·농구와 함께 ‘4대 프로 종목’인 배구의 현주소가 이러한데 다른 비인기종목의 비애야 오죽할까. 뿌린 것 없이 거두기만 하려는 건 ‘도둑 심보’나 다름없다.
선수들에게 최상의 여건을 갖춰주진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여건은 제공한 뒤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순리이자 도리가 아닐까.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