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연구팀만 15개 “학문의 벽 허문 덕”
“학문의 벽을 허물고 미친 듯이 공동 연구에 매달리다 보니 한 해 논문이 50개나 되더라고요.” ‘키토산 박사’로 불리는 한국 이공계의 원로급 교수가 지난해 국제적인 학술지에 논문을 50편이나 발표해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주인공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의 조종수(63) 교수. 그는 “공동 연구자들의 성과였고, 운도 좋았다.”며 겸손해했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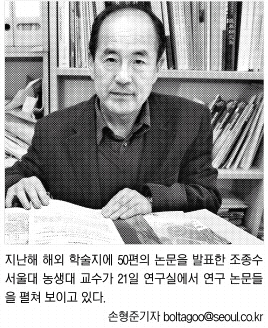
다작의 비결은 무엇보다 ‘학문의 벽’을 허문 데 있다. 그가 현재 진행중인 연구는 의대, 공대, 농생대, 치대, 약대, 수의대 등 광범위한 학문 분야에 흩어져 있다. 공동 연구팀만 15개에 이른다. 그는 “공동 관심사를 가진 연구자를 만나면 ‘당신 아이디어와 내 아이디어가 만나면 새로운 것이 나온다.’며 연구 과제를 만들어 낸다.”면서 “여러 방면에 호기심을 갖다 보니 해마다 논문 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키토산’이 여러 분야에서 활용된다는 점도 다작의 한 원인이다. 그는 키토산을 유전자 치료 물질의 개발에 활용하는 방법과 조직 공학 기법을 도입해 인공 장기를 개발하는 방법 등을 연구했다. 최근에는 고분자 공학을 이용해 쇠고기의 육질을 개선하는 사료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2004년에는 세계 생체재료학회에서 우수연구상을 받았고,2006년에는 서울대 상록연구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신설된 ‘서울대 연구력 향상 공로 교수’에 선정되기도 했다.
늘 승승장구한 것은 아니다. 지방의 모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던 시절, 대학원생들의 논문 표절을 눈감아 주는 관례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실험실을 빼앗기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퇴짜’를 맞은 적도 허다했다. 조 교수는 “의미있는 논문이라고 생각해 학술지에 냈는데 혹독한 평가를 받고 돌아올 때도 많았다.”면서 “자존심이 상했지만 끈질기게 보완해서 결국 통과시키다 보니 퇴짜율이 점점 줄었고, 지금은 성공률이 80% 정도”라며 여유있게 웃었다.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하루 13시간을 연구실에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 열중하는 그도 ‘이공계 위기´에는 아쉬움을 숨기지 못했다. 빨리 졸업해서 월급 많이 받는 일을 택해 안정을 찾으려는 후배들이 안쓰럽기만 하다. “공부를 좋아한다면 길게 보고 도전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는 만큼 나오는 게 공부 아닌가요. 환갑을 넘긴 제가 이렇게 인정받으며 활동할 수 있다는 게 바로 학문의 매력입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8-01-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