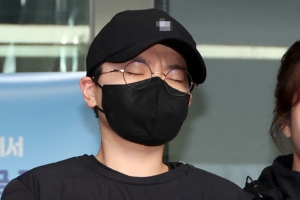정은귀 한국외대 영문학과 교수
닷새 되던 날에
강을 연구했던 과학자들은
강에 대해 말하거나
강을 연구하는 게 금지되었다.
공기를 연구한 과학자들은
공기에 대해 말하지 말아야 했고
농부를 위해 일하던 이들도 역시
침묵당했다,
또 벌을 위해 일하던 이들도.
누군가, 깊은 불모지에서 온 이가
사실들을 게시하기 시작했다
사실들은 말하면 안 되는 거여서
삭제되었다
사실들은, 삭제에 놀라서, 침묵했다.
이제 강에 대해 말하는 것은
강뿐이다.
― 제인 허시필드 ‘닷새 되던 날에’ 중
공부를 하면 공부한 것에 대해,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진다. 열망이란 그처럼 가슴 뛰는 일이다. 그런데 그게 막히고 좌절된다면? 강제된 침묵 속에서 그나마 말을 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 사실들도 곧 삭제된다면?
삭제와 검열, 침묵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건 인간이 아니라 자연이라고 시인은 말한다. 이 시는 최근 더욱 가팔라진 기후위기를 서늘하게 바라보는 시선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의 위기와 재갈 물린 입에 대한 남다른 통찰이기도 하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를 위해 말하는 일을 포기할 때, 머잖아 우리를 위해 말해 주는 이들도 사라진다. 마침내 아무도 우리를 위해 말해 주지 않는다. 그 엄연한 현실, 우리가 문제의식으로 느끼고 있지만 차마 용기 내어 말하지 못하는 것을 시인은 비스듬히 일깨운다.
이런 상황, 우리는 자주 겪었다. 통제와 검열이라는 이름으로. 불편하고 위험한 진실은 감추는 것이 온당하다는 듯 애써 위로하며 평온을 가장한다. 급기야 세상이 붕괴되는 것도 모르고 말이다. 결국 말하는 것은 강이고 바람이다. 입도, 귀도, 혀도 없는 존재들이다. 강은 강에 대해, 돌에 대해, 대기에 대해 말한다. 시 후반부에 등장하는 말하는 이는 다 미약한 존재들이다. 버스 기사, 매장에 상품 진열하는 사람, 실험실 기술자가 말한다. 침묵에 대해. 물도 흙도 병들어 생명이 깃들기 어려워진 세상에 대해.
문득 상상해 본다. 시에 대해 얘기 못 하게 하면 어떻게 하지? 아마 나만의 일기장에라도 뭔가를 끄적거리고 있겠지? 강이 강에 대해, 침묵이 침묵에 대해 말하듯 말이다. 시인의 시 쓰기는 그처럼 말할 수 없음을 응시하면서 말할 수 없음을 기어이 말하는 작업이다.
검열과 침묵과 외면으로 붕괴되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희망을 찾으려 한다. 진실은 작은 외침에서 시작한다는 걸 잊지 않기에 그는 말한다. 우리에겐 말할 수 없음을 말할 수 있는 시공간이 있다고. 거기서 작은 변화가 시작된다고 시인은 믿는다. 그가 전하는 서늘하고도 단단한 시의 언어를 나는 고맙게 받아 적는다.
말할 수 없음을 말하기 위해.
2023-09-26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