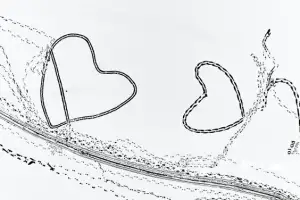워싱턴 포스트의 밥 우드워드 기자는 1972년 미국 민주당사에 정체불명의 괴한이 침임한 사건이 터진 후에 동료 기자인 칼 번스타인과 함께 몇 달 동안 이 사건을 집중 취재한 공로로 보도부문의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우드워드의 취재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취재원의 이름은 지난 30여년간 공개되지 않았다. 우드워드는 이 취재원의 이름 대신 당시 화제를 모았던 성인영화의 제목을 따서 ‘딥 스로트’라는 암호로 인용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결국 의회의 탄핵을 소추받기 직전에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닉슨 사임 이후 남은 미스터리는 ‘딥 스로트’란 익명의 취재원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다. 일부에서는 알렉산더 헤이그나 헨리 키신저를 지목했다. 실체는 없고 가공의 인물이란 주장도 나왔다. 역사를 바꾼 이 익명의 취재원의 정체는 30여년이 지나서야 당시 FBI 부국장이던 마크 펠트라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우드워드와 ‘딥 스로트’의 사연은 여러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는 기자와 취재원의 신뢰관계이다. 우드워드는 취재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익명으로 처리했고, 당사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두번째 주목할 만한 사실은 워싱턴 포스트 내에서 ‘딥 스로트’의 실체를 알았던 사람은 딱 세명이었다는 점이다. 우드워드 본인과 번스타인 기자, 그리고 직속상사인 벤 브래들리 편집국장이었다. 데스크는 기사의 정확성을 위해 취재원의 신분을 요구했지만 역시 비밀을 지켰다. 브래들리 편집국장은 심지어 사주인 케서린 그레이엄에게도 비밀을 털어놓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사실은 언론과 독자와의 신뢰이다. 비록 우드워드가 기사에서 핵심 취재원을 익명으로 처리했지만 독자들은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신뢰했다. 우드워드의 보도가 단지 한 취재원에게만 의존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드워드는 ‘딥 스로트’가 제공한 정보가 적어도 2인 이상의 다른 취재원에 의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기사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할 정도로 정보의 확인에 철저했다.
우리 나라의 언론에서도 익명의 취재원은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지난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 언론윤리의 현주소’란 워크숍에서 한국언론재단의 남재일 연구위원은 국내 기자 3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38%가 ‘최근 2년간 익명취재원 1명의 말을 토대로 특정인이나 특정기관을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한 경우가 한 차례 이상 있다.’고 응답했다.‘실제로 취재하지 않고 익명의 출처를 내세워 자신의 견해를 취재원의 견해인 것처럼 인용한 경우도 24%나 됐다.
서울신문의 경우 익명 취재원의 인용이 다른 언론에 비해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 22일자 지면을 보면 2면의 6자회담 기사는 ‘회담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을 인용했고,3면의 행정도시 명칭 기사는 ‘건설청 관계자’를 인용했다.6면의 행시관련 기사는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를, 정부기관의 대금지급 관련 기사는 ‘조달청 관계자’를 각각 인용했다, 같은 날 12면의 법원과 검찰의 갈등에 관한 기획기사에서도 ‘검찰 관계자’와 법원 관계자’가 각각 익명으로 인용됐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권위주의가 남아있고 언로가 자유롭지 않은 취재환경에서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하는 보도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국가간에 외교적인 이유로 익명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취재원이 익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민감한 정보나 의견을 얻어내기 위하여 익명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도한 익명의 처리는 언론과 독자의 신뢰쌓기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익명 취재원의 인용에 관하여 일선 기자와 데스크의 좀 더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심재웅 한국리서치 상무이사
닉슨 사임 이후 남은 미스터리는 ‘딥 스로트’란 익명의 취재원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다. 일부에서는 알렉산더 헤이그나 헨리 키신저를 지목했다. 실체는 없고 가공의 인물이란 주장도 나왔다. 역사를 바꾼 이 익명의 취재원의 정체는 30여년이 지나서야 당시 FBI 부국장이던 마크 펠트라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우드워드와 ‘딥 스로트’의 사연은 여러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는 기자와 취재원의 신뢰관계이다. 우드워드는 취재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익명으로 처리했고, 당사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두번째 주목할 만한 사실은 워싱턴 포스트 내에서 ‘딥 스로트’의 실체를 알았던 사람은 딱 세명이었다는 점이다. 우드워드 본인과 번스타인 기자, 그리고 직속상사인 벤 브래들리 편집국장이었다. 데스크는 기사의 정확성을 위해 취재원의 신분을 요구했지만 역시 비밀을 지켰다. 브래들리 편집국장은 심지어 사주인 케서린 그레이엄에게도 비밀을 털어놓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사실은 언론과 독자와의 신뢰이다. 비록 우드워드가 기사에서 핵심 취재원을 익명으로 처리했지만 독자들은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신뢰했다. 우드워드의 보도가 단지 한 취재원에게만 의존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드워드는 ‘딥 스로트’가 제공한 정보가 적어도 2인 이상의 다른 취재원에 의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기사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할 정도로 정보의 확인에 철저했다.
우리 나라의 언론에서도 익명의 취재원은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지난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 언론윤리의 현주소’란 워크숍에서 한국언론재단의 남재일 연구위원은 국내 기자 3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38%가 ‘최근 2년간 익명취재원 1명의 말을 토대로 특정인이나 특정기관을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한 경우가 한 차례 이상 있다.’고 응답했다.‘실제로 취재하지 않고 익명의 출처를 내세워 자신의 견해를 취재원의 견해인 것처럼 인용한 경우도 24%나 됐다.
서울신문의 경우 익명 취재원의 인용이 다른 언론에 비해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 22일자 지면을 보면 2면의 6자회담 기사는 ‘회담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을 인용했고,3면의 행정도시 명칭 기사는 ‘건설청 관계자’를 인용했다.6면의 행시관련 기사는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를, 정부기관의 대금지급 관련 기사는 ‘조달청 관계자’를 각각 인용했다, 같은 날 12면의 법원과 검찰의 갈등에 관한 기획기사에서도 ‘검찰 관계자’와 법원 관계자’가 각각 익명으로 인용됐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권위주의가 남아있고 언로가 자유롭지 않은 취재환경에서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하는 보도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국가간에 외교적인 이유로 익명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취재원이 익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민감한 정보나 의견을 얻어내기 위하여 익명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도한 익명의 처리는 언론과 독자의 신뢰쌓기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익명 취재원의 인용에 관하여 일선 기자와 데스크의 좀 더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심재웅 한국리서치 상무이사
2006-12-26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