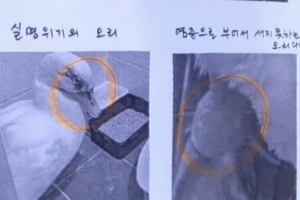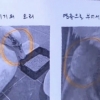정형근 서울 정원여중 교사
요즘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로 올라온 신경숙 작가의 표절 논쟁을 보면서 이 일화가 떠올랐다. 사실 예술작품에서 표절과 패러디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김상용 시인의 시 ‘남으로 창을 내겠소’의 마지막 구절 ‘왜 사냐건 웃지요’는 중국의 시선이라 불리는 이백의 ‘산중문답’의 ‘그대 왜 산 속에 사느냐고 묻지만, 나 웃을 뿐 대답 않으나 내 마음 한가로워’라는 구절과 유사하다. 또한 미국의 팝아트 작가인 앤디 워홀이 메를린 먼로의 그림을 배치한 것을 두고도 그것이 창작품인지 아닌지 아리송하다. 그만큼 표절과 패러디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가르기는 어렵다.
창작 분야가 아닌 학문 분야에서는 내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용이라는 장치를 통해 나의 글에 넣을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창작 분야에서만 유사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표절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일까.
아마도 창의성이나 새로움, 개성, 색다름이 바로 창작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밤새 글을 썼다가 어디선가 본 듯한 유사함이 있고 스스로 참신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글쓰기를 멈추고 썼던 글을 휴지통에 버리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표절과 패러디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 그렇지만 자신의 예술 행위가 표절인지 아니면 패러디인지는 그것을 쓴 작가는 알고 있을 것이다.
‘우국’을 번역한 김후란 시인은 “작가가 ‘전설’을 쓸 때 분명 자신의 입장이 있었을 것”(서울신문 2015년 6월 18일자 22면)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 가슴 아프게 와 닿는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회 지도층의 표절 문제가 논란이 된 적이 많지만 신경숙 작가의 사건처럼 큰 반향을 울리진 않았다. 그만큼 사회가 문학과 작가에게 도덕성과 양심을 기대했던 것이리라.
문단에서 표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한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이 표절 논란을 잠재울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이미 신경숙 소설에 대해 15년 전부터 문제 제기가 있어 왔는데도 문단 내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보면 외부의 감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외부의 감시는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고 검토할 수 있는 언론이 돼야 한다.
문학 권력에 대한 긴급진단(서울신문 6월 24~26일자)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진단했던 서울신문에서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었으면 한다. 표절의 문제는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는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생각이나 개성을 훔치는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이다.
2015-07-08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