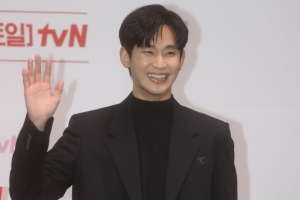패럴리 형제의 1994년 작, ‘덤 앤 더머’는 영화의 역사에서 가장 유쾌한 대명사를 만들어낸 코미디계의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지난 20년간 소소한 실수를 거듭하는 커플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덤 앤 더머’라는 애칭을 붙여 줬던가. 그러나 속편을 만들기까지 이렇게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은 그런 인기에 대한 부담감 또한 만만치 않았음을 짐작게 한다. 전편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더욱 가중됐을 압박감 속에서 감독과 주연 등 오리지널 멤버들이 야심 차게 재회한 ‘덤 앤 더머 투’(Dumb and Dumber To)의 소구점은 명확하다. 30대 이상의 관객들에게는 이 세계적인 바보 커플의 건재함을, 전편을 보지 못한 어린 관객들에게는 전설의 실체를 확인시키는 것이다.
그 첫 번째 단계로, ‘덤 앤 더머 투’는 제작진이 이토록 늦은 속편에 대해 해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로이드는 오로지 해리를 놀려 먹기 위해 20년간 정신병원에서 환자 행세를 한다. 마침내 해리의 넋이 나간 표정을 본 로이드는 박장대소하며 흡족해한다. 정신병원에서 청춘을 보낸 아쉬움 따위는 이 놀랍도록 긍정적인 인물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 로이드를 간호하는 데 수십 년을 바친 해리 또한 곧바로 그의 개그가 훌륭했음을 인정한다. 여기서 해리는 로이드에게 “10년만 환자인 척했어도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로이드는 이렇게 답한다. “그렇지. 하지만 죽여줄 정도는 아니었겠지.” 그저 괜찮은 정도의 속편이 아닌, 전편의 명성을 뛰어넘을 만한 개그를 보여주기 위해 제작진에게는 장장 스무 해의 세월 및 그 기간만큼의 희생과 노력이 필요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처럼 기대를 한껏 부풀린 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두 번째 ‘덤 앤 더머’의 여정(to)은 사실 기발하고 도전적이기보다 평이하고 안정적인 편이다. 그것은 해리와 로이드가 존재조차 몰랐던 딸을 찾아 나선다는 설정에서 이미 판가름 난다. 가능한 모든 종류의 시추에이션 코미디가 총망라돼 있지만 전편의 스키장 시퀀스처럼 강력한 인상을 남길 만큼의 한 방을 찾기는 어렵다. 영원히 만인의 고전으로 남아야 한다는 강박의 덫에 걸린 것일까. 모험이나 실험은 애초에 포기한 듯한 태도가 못내 아쉽다.
그러나 전편의 후광을 걷어낸다면 ‘덤 앤 더머 투’는 ‘들을 거리’와 ‘볼거리’를 고루 제공하며 여전히 고유의 영역을 지키고 있는 독보적인 코미디다. 천재적 작가들이 쓴 것이 틀림없는 해리와 로이드의 모자란 대사들은 시종일관 관객들의 입꼬리를 실룩거리게 만든다. 중년을 넘어선 짐 캐리와 제프 대니얼스의 슬랩스틱 또한 진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덤 앤 더머’ 시리즈의 특별함을 부각시킨다. 이들의 앙상블이야말로 이 늦된 속편을 기다려 온 보람이 아닐까. 또다시 20년이 흘러 3편에서도 두 사람을 함께 보게 된다면 우리는 감격해서 웬만한 멜로드라마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겠다.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하기만 한 해리와 로이드의 안녕을 빈다. 27일 개봉. 15세 관람가.
윤성은 영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