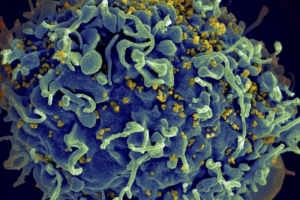로랑 캉테의 시선은 건조하면서도 뜨겁다. 인간이 아무리 선의에서 행동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최선의 의도인지 그는 질문한다. 공동체는 바깥 시스템의 억압으로 인해 파괴되는 것이 아니다. ‘폭스파이어’는 공동체가 내부에서부터 붕괴되는 과정을 끈질기게 바라본다. 조이스 캐럴 오츠가 1993년에 발표한 동명의 소설을 영화화했다기보다 1950년대에 실재했던 소녀들의 공동체를 재연한 영화로 보인다(안젤리나 졸리가 주연을 맡은 1996년 버전은 소녀들의 일회성 일탈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점에서 캉테의 버전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캉테의 버전은 10대소녀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품었던 캐럴 오츠의 원작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들었으며, 인간과 시스템을 성실하게 읽어온 캉테는 어느덧 문화인류학자의 태도로 시대와 인간에 접근했다.
전작 ‘클래스’로 10대와 학교의 현실을 정면으로 다룬 바 있는 캉테는 다시 비전문 배우들을 캐스팅해 1950년대 미국 소녀들의 이야기에 도전했다. ‘폭스파이어’는 조직의 리더인 렉스의 이야기이면서 조직의 역사를 기록한 매디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시간이 흘러 평범하게 살아가는 매디는 신문을 통해 사진 한 장을 접한다. 사진 속 게릴라의 모습이 렉스인지 그녀는 확신하지 못한다(혹은 아픈 기억을 거부한다). 그러나 그녀는 한때 마음속에서 불타올랐던 매서운 불꽃을 잊지 못한다. 그것만으로 그녀의 10대는 값어치를 지닌다. 21세기 아이들에게 정열이 없다고 질책하는 대신 ‘폭스파이어’는 청춘은 불꽃만으로 충분히 아름답다고 말한다. 143분. 15세 관람가.
영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