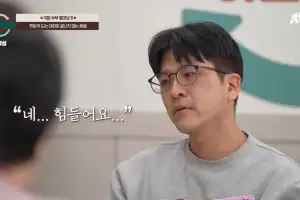주인공은 최영석(32) 감독. 그가 이끄는 태국팀은 첫날 4개 체급에서 은2, 동1개를 따내는 기염을 토했다. 여자 63㎏급의 프렘와에브 송나파스는 한국의 금 후보 진채린을 격파, 결승에 올랐다. 남자 54㎏급의 솜솽 바사밧은 결승에서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요르단 선수에게 금을 내줬다. 비록 금은 놓쳤지만 태국 언론인들은 “코치 최 덕분”이라며 연신 손가락을 치켜들었다.
최 감독이 외국지도자 생활을 꿈꾼 것은 풍생고 시절부터였다. 스페인대표팀을 이끌고 전지훈련을 온 고교 선배의 모습에 반했던 것.
선수층이 두꺼운 국내에서 태극마크를 한 번도 달지 못했다. 하지만 일찌감치 지도자로 나서면서 숨은 역량을 드러냈다.2000년 바레인대표팀을 맡아 지도력을 인정받은 것. 바레인협회에서는 부산아시안게임까지 그를 붙잡아두려 했지만 2001년 말 홀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신 바람에 급거 귀국했다.
잠시 국내에 머물던 최 감독은 2002년 2월 ‘제2의 고향’이 된 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무에타이의 나라 태국에서 태권도는 생소했다. 최 감독의 헌신적인 조련 아래 부산대회에서 은 2, 아테네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는 등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태국협회에서 2008년 베이징올림픽까지 계약을 연장하자고 매달린 것이 당연했다. 지난 6월에는 태국체육기자협회로부터 ‘2005년 최우수지도자상’을 받았고 국영방송 ITV에선 그를 집중조명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다.
비결이 궁금했다. 최 감독이 체득한 노하우는 태권도와 태국 격투기의 장점을 접목시키는 것. 최근 국제무대에서 태국이 ‘한국킬러’로 불리는 소감을 물었다.“솔직히 기분 좋습니다. 한국 지도자의 주가가 높아지는 셈이니까요.”라며 총총히 선수들을 이끌고 자리를 떴다.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