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일 첫 시집 ‘냄새의… ’
현란하게 짜인 표현도, 세상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도 찾기 힘들다. 대신 느긋하고 일상적인 언어들의 교직(交織), 그 안에서 풍기는 사람들의 냄새가 한 편 시가 된다.시인 차주일(49)의 시에서는 심미적 표현과 비판의 언어가, 밭에서 듣는 촌로(村)의 방언이나 늙은 어머니의 울음소리에 모두 압도돼 버린다.


시인 차주일
시인의 기억 속 존재들은 일정한 내러티브를 가지고 작품 속에 등장한다. 한 예로 ‘일향의 어원을 찾아서’에서는 ‘일향’이란 마을을 지나던 시인이 ‘일행’이란 이름의 노인을 만난다. 밭일 하던 노인은 시인과 나란히 서서 오줌을 누는데, 시인이 슬쩍 ‘아랫도리’를 훔쳐보자 노인은 두 손으로 그걸 감춘다.
시인은 그 손 모양을 두고 ‘잡은 오른손이 연필 쥔 모양이고 왼손은 편지지 누르고 있는 모양’이라며 오줌발이 닿는 밭이랑에서 ‘아드라일거보아라바테서캔고구마보냉께마시께쩌머거라.’는 노인의 편지를 읽어낸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소리 나는 대로 받아쓰기하던’ 어린 자신과 만나는 경험을 한다.
작품 속 가장 흔한 등장인물인 가족, 특히 어머니에 대한 기억도 그러하다. 기억 속 어머니는 종가의 대소사에 치여 마루에서 울다 잠을 자고, 결국 치매 속에서 흐릿한 죽음을 맞는다. 하지만 시인은 그런 어머니에게서 ‘닦을수록 어두워지는 / 어두워질수록 빛나는’ 존재의 아이러니한 속성을 읽어내기도 한다.
시인이 인물들을 되살려내는 데는 감각적인 심상(心象)들이 동원되기도 한다. 사실 기억 속에 있는 존재들은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스치는 감각으로만 남는 경우가 많은데, 시인은 이를 예민하게 집어낸다.
흔히 나오는 시청각적 심상은 물론 ‘밤 11시 넘어 반지하 철문을 연다. 보증금 천에 월세 사십의 집주인은 냄새다. 11년째 바뀐 적 없는 이 집의 주인이 되어보려고, (중략) 냄새는 도무지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았다.’(‘냄새의 소유권’ 중)처럼 시인은 ‘냄새’조차도 존재의 정체성과 연결시킨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같은 수건으로 냄새를 공유하고, 냄새에 이끌려 가출한 사람이 돌아오는 상황을 그린다. 이를 통해 시인은 독자들이 개인의 기억 속에 있는 감각을 상기하게 만들고, 그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 또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던지게 한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4-10 2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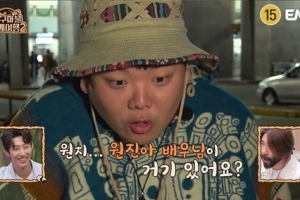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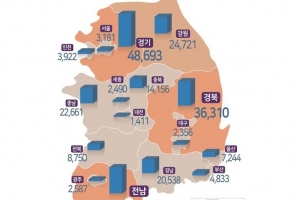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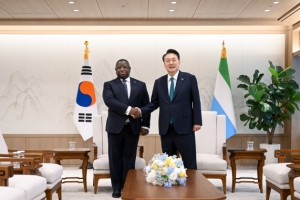










![전쟁·기후변화… 공멸해 가는 인류 깨우다[OTT 언박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2/16/SSC_20240216012138_N.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