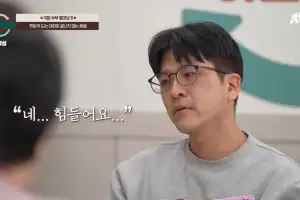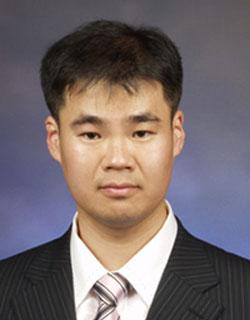
김동현 산업부 기자
그런 아파트가 애물단지가 됐다. 시작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였다.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오를 것이라는 시민들의 예상은 빗나갔고 5년째 아파트값은 힘을 못 쓰고 있다. 그러는 사이 우리에게 친숙해진 단어가 ‘하우스 푸어’다.
우리 사회에서 하우스 푸어를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부동산 투기에 편승했던 사람들’이라는 시선이다. 이들은 집값이 앞으로 30~40%가 더 떨어져 서민들이 쉽게 집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나머지 하나는 ‘집 한 채 장만하려다 발목 잡힌 사람들’이라는 시선이다. 이들은 집값이 다시 반등해야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우스 푸어를 하나의 특징을 가진 이들로 바라보기는 힘들다. 수억원짜리 집을 빚을 내 사면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이들을 데리고 2년마다 이리저리 이사를 가야 하는 가장이 빚을 내서라도 집을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대부분 월급쟁이들에게 집은 삶의 공간인 동시에 하나뿐인 자산이다. 한국 사회에서 하우스 푸어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 스스로 하우스 푸어라고 이야기하는 한 40대 가장은 “집값이 다시 팍팍 뛰어야 한다는 말도, 30~40%씩 떨어져야 한다는 말도 다 저주로 들린다”면서 “그냥 더 이상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은행이자를 내고 손해를 안 보는 정도면 좋겠다”고 말한다. 아마 대부분의 월급쟁이 하우스 푸어들이 갖는 생각일 것이다.
한 선배에게 “집값은 떨어져도, 올라도 문제”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당연한 말씀”이라는 핀잔을 들었다. 하지만 이 당연한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별로 없다. 집이 삶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사는 것 같다.
moses@seoul.co.kr
2013-04-06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