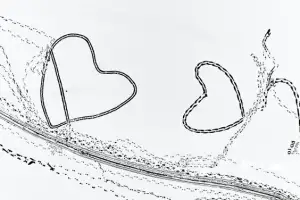서울 종로 가회동 31번지. 북촌 한옥마을의 중심이다. 오랫동안 4대문 안에서 살아왔어도 그곳을 가보지 못한 이들이 의외로 많다. 동료 P부장도 그 중 하나다. 점심 나절, 그의 청에 못이겨 가회새싹길 언덕배기를 걸었다. 그런데 마냥 즐거워하던 그의 표정이 왠지 뜨악하다. 그동안 그려온 한옥마을의 로망이 깨지기라도 한 것일까. 양반들이 살던 마을이니 어쩌면 찬란한 솟을대문의 고택 분위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북촌 한옥마을은 그런 곳이 아니었다. 원주민은 떠나고 ‘외지인의 별장촌’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법도 하건만 그는 사뭇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랬다. 북촌 한옥마을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인간의 냄새를 맡긴 어려웠다. 고졸한 한옥의 미학을 찾기 힘들었다. 역사도 문화도 거세된 공간. 좀 심하게 말하면 그곳은 삼삼오오 떼지어 사진기 셔터를 눌러대는 일본 여성, ‘카메라 조시(カメラ女子)’의 놀이터였다. 누가 ‘한옥 르네상스’를 이야기하는가. 한옥의 복권은 아직 멀었다.
김종면 논설위원 jmkim@seoul.co.kr
그랬다. 북촌 한옥마을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인간의 냄새를 맡긴 어려웠다. 고졸한 한옥의 미학을 찾기 힘들었다. 역사도 문화도 거세된 공간. 좀 심하게 말하면 그곳은 삼삼오오 떼지어 사진기 셔터를 눌러대는 일본 여성, ‘카메라 조시(カメラ女子)’의 놀이터였다. 누가 ‘한옥 르네상스’를 이야기하는가. 한옥의 복권은 아직 멀었다.
김종면 논설위원 jmkim@seoul.co.kr
2009-11-0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