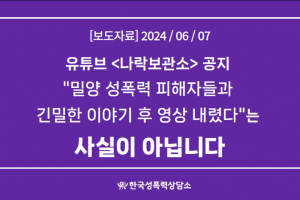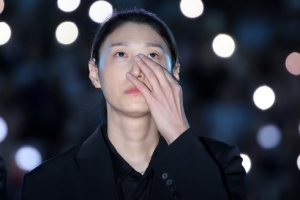‘ㄱ’은 ‘기윽’이 아니라 ‘기역’이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그러나 다른 자음 이름들과 비교하면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읓, 키읔, 티읕, 피읖, 히읗. 거의 해당 자음에 ‘ㅣ’와 ‘ㅡ’가 결합된 형태다. 예외는 기역, 디귿, 시옷 딱 세 가지다.
이렇게 된 데는 조선 중종 때 최세진의 역할이 컸다. 최세진은 역관이었다. 중종실록은 최세진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힘썼으며 한어(漢語)에 정통했다. 과거에 급제해서는 사대(事大)에 관한 이문(吏文)을 모두 그가 맡아 보았다. 발탁되어 벼슬이 2품(品)에 이르렀다. 저서인 ‘언해효경’, ‘훈몽자회’, ‘이문집람’이 세상에 널리 퍼졌다.” ‘한어’는 중국어, ‘이문’은 조선 시대 중국과 주고받던 문서에 쓰던 특수한 관용 공문의 용어나 문체를 말한다.
최세진은 이처럼 인정받았고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한어 교재를 번역하면서 한글에 대해 깊이 있는 식견을 갖게 됐다. 그가 남긴 ‘훈몽자회’, ‘번역노걸대’, ‘번역박통사’ 같은 책들에는 당시 쓰이던 어휘가 풍부하게 기록돼 있다.
최세진은 ‘훈몽자회’에서 한글 자음과 모음의 이름을 정리했다. 그가 역관이 아니라 국어학자로 알려진 이유일 것이다. ‘훈몽자회’는 본래 어린이용 한자 학습서였다. 자습서 성격이었다. 그렇다 보니 먼저 한글을 알려야 했다. 책 첫머리에 한글의 용법에 대한 설명을 해 놓았다.
ㄱ: 기역(基役), ㄴ: 니은(尼隱), ㄷ: 디귿(池[末]), ㄹ: 리을(梨乙), ㅁ: 미음(眉音), ㅂ: 비읍(非邑), ㅅ: 시옷(時[衣]), ㅇ: 이응(異凝)
한자로 이렇게 적어서 첫소리(초성)와 끝소리(종성)가 어떻다는 것을 설명했다. 한데 문제가 생겼다. 한자에 발음이 ‘윽’, ‘읃’, ‘읏’인 글자가 없었다. 할 수 없이 ‘윽’은 ‘역’(役) 자를 가져다 적었다. ‘기윽’이 아니라 ‘기역’이 돼 버렸다. ‘디귿’은 ‘지말’(池[末])이라고 적었는데, 읽으면 ‘디귿’이 됐다. ‘지’(池)는 16세기에 ‘디’로 발음했다. ‘끝(귿) 말’(末) 자에는 동그라미를 둘렀다. 음으로 읽지 말고 훈(‘귿’)으로 읽으라는 의미였다. ‘디귿’으로 읽게 된다.
‘시옷’(時[衣])도 ‘디귿’처럼 읽은 결과다. ‘시’(時)와 ‘옷’(衣)으로 읽게 했다. ‘기역, 디귿, 시옷’은 이렇게 해서 더 굳어져 갔다. 현재의 우리 맞춤법에도 영향을 줬다.
‘기역, 디귿, 시옷’으로 굳어진 이름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있다. ‘기윽, 디읃, 시읏’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역, 디귿, 시옷’은 비합리적이고 과학적이지 않다고 한다. 한류 한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키읔, 티읕, 지읒’과도 달라 한글을 처음 배우는 이들은 헷갈린다는 것이다.
북녘에서는 ‘기윽, 디읃, 시읏’이 됐다. ‘ㄱ, ㄷ, ㅅ’의 이름을 다른 글자의 이름과 같은 방식으로 바꾸었다. 이 이름들을 ‘그, 느, 드, 르, 므…’라고 한 음절로 부르기도 한다. 북녘의 사전에는 속담 “낫 놓고 ‘기역’ 자도 모른다”가 “낫 놓고 ‘기윽’ 자도 모른다”라고 적혀 있다.
이경우 기자 w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