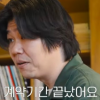문인들이 그리게 될 세계지도… 시리즈 1탄 ‘지나치게 산문적인 거리’ 펴낸 이광호 문학평론가
문인들이 디딘 발걸음으로 세계지도를 그린다. 명소만 찍고 사라지는 관광객의 자취가 아니다. 골목 하나에도 애정과 연민을 품는 ‘동네 사람’의 시선으로 옮긴 걸음걸음이다. 산책은 사유로, 사유는 글쓰기로 연결됐다. 문학동네 임프린트 난다의 새 시리즈 ‘걸어본다’이다. 세계 곳곳에 사는 작가들에게 저마다의 고향과 동네 이야기를 접수했더니 세계지도가 그려졌다. 강석경 작가는 자신이 살고 있는 경북 경주를, 재독 시인 허수경은 독일인 남편과 결혼하며 터전이 된 뮌스터를, 소설가 강병융은 교수로 일하고 있는 슬로베니아 류블랴나를, 황현산 문학평론가는 고향인 전남 비금도를 산책한 기록을 차례로 내놓는다. 첫걸음으로 ‘지나치게 산문적인 거리-용산에서의 독백’을 펴낸 이광호(51·서울예대 교수) 문학평론가를 8일 서울 용산의 한 대안공간에서 만났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뒷골목에 기대 서 있는 이광호 문학평론가. 그는 “근·현대문학이 도시에서의 체험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근대문학 연구자로서 내게 도시는 공부하는 공간”이라고 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신문 라이브러리

자신의 동네와 고향을 거닐며 사유한 기록을 잇따라 내놓을 황현산 문학평론가, 강석경 작가, 허수경 시인(왼쪽부터).
서울신문 라이브러리
서울신문 라이브러리
왜 용산이었을까. 용산은 그가 4년째 살고 있는 동네이기도 하지만 ‘산문 쓰기 좋은 동네’, 바꿔 말하면 ‘이야기가 많은 동네’이다. 그를 매료시킨 건 분주한 변화와 과잉으로 하나의 ‘거대한 가설무대’ 같은 용산이 품고 있는 참혹함과 혼종성이었다.
“한양도성의 주변부였던 용산에는 몽고, 일본 등 식민과 이식의 역사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부르는 이태원에 이태원(異胎圓·왜군이 당시 이 지역에 있었던 절 운종사에서 비구니들에게 성적 폭력을 가했다는 사실과 관련)이라는 뜻도 있었다는 게 얼마나 참혹해요. 미군 부대 때문에 개발이 억제된 것도, 그게 풀려서 황당한 개발이 이뤄지는 것도, 용산 참사가 벌어진 것도 참혹한 시간들의 연장인 셈이죠.”


공간의 사회적, 미학적 의미를 짚어내는 사유의 문장과 시적인 문장이 교차하는 글에는 이 시간의 기억들이 단절되고 망각된다는 데 대한 안타까움과 무력감이 배어 있다.
“산책을 하다 보면 ‘주상복합 옆에 왜 저런 허름한 골목이 있지?’, ‘청파동에는 왜 적산가옥들이 눈에 띄지?’ 신기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식민의 체험은 보존하지 않습니다. 잊고 싶은 기억을 떠올린다는 건 참혹하고 쓸쓸한 일이지만, 장소의 현재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글을 쓰다 보니 장소는 곧 시간이었어요. 지금 내 감각이 느끼는 현재적인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장소가 겪어왔던 시간의 흔적들이기도 하죠. 후자도 중요하거든요.”
참혹한 시간을 견뎌온 용산이지만 그는 그 안에서 가능성을 본다. 혼종성 때문이다. 이태원 이슬람사원에서 시작되는 우사단길이 대표적이다. 신성한 사원 바로 밑에서는 밤이면 게이바와 트랜스바가 흥성거린다. 깊고 불안한 눈으로 전화 부스에 매달려 있는 아랍 청년과 이태원 토박이 노인, 재기발랄한 젊은 예술가들이 함께 어우러진다.
“어떻게 보면 매우 이질적인 존재들이 섞여 있는 것 같지만 문화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거대 자본이나 기업이 들어와서, 혹은 뉴타운 같은 폭력적인 개발로 동네가 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소통으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용산은 그래서 서울뿐 아니라 한국의 근현대사를 성찰하게 한다. 그 성찰은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넌지시 가리킨다. “용산 참사를 보면 개발이 갖고 있는 그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자, 미군기지를 생각하면 개발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아이러니가 실현되는 곳이죠. 개발의 폐해, 개발이 강제로 억눌렸을 때의 문제들이 집약돼 있어 공간·개발의 문제가 늘 이슈인 한국 사회에 큰 상징성을 지닙니다.”
도시인에게는 ‘어차피 도시에서 살아야 한다’는 전제가 주어진다. 그렇다면 도시에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곧 자신의 삶을 어떻게 디자인할지와 연결된다. 저자의 사유가 그 징검다리가 된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4-06-09 18면



























![전쟁·기후변화… 공멸해 가는 인류 깨우다[OTT 언박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2/16/SSC_20240216012138_N.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