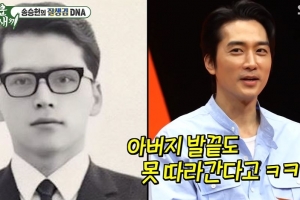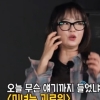우리의 숙원이던 쌀 자급을 이룬 통일벼는 조그마한 키로 인한 재배 과정의 뒷얘기가 여럿 전해진다. 통일벼의 키는 일반벼의 3분의2밖에 안 된다. 몸피는 작아도 아주 야무져서 일반벼와 달리 쓰러짐이 덜하고 병해충에도 강해 수확량이 기존 벼보다 30% 정도나 더 많았다. 작은 키 때문에 잃은 것도 있었다. 밥맛이 덜하다는 것과는 별개로 볏짚 또한 사료용과 연료용 외엔 별 쓸모가 없었다. 새끼를 꼬거나 가마니를 짜고, 초가지붕을 이을 때도 일반벼보다 물량이 많이 달렸다. 소의 여물로 쓰기에도 마땅찮았다. 밥맛이 떨어지는 통일벼의 볏짚이 소에겐들 뭐 그리 달랐을까.
통일벼는 1971년 ‘통일벼 박사’ 허문회 교수가 이끈 수원 농대(현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연구팀에 의해 개발돼 다음 해 농가에 보급됐다. 동남아시아 등 열대지역에 잘 적응하는 인디카 품종과 온대지역에서 주로 재배하는 자포니카 품종을 교잡한 것이다. 당시 통일벼는 ‘기적의 벼’로 불렸다. 하지만 보급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농가에서는 검증이 안 됐다며 재배를 기피했다. 통일벼가 보급되기 전에는 밥알에 윤기가 있고, 맛 또한 좋은 ‘아끼바레’(秋晴)란 일반벼 품종을 주로 심었다. 당시 두 품종의 품질 차를 빗대 정부미(통일벼)와 일반미(아끼바레)로 불리기도 했다. 여름 냉해가 심해 쭉정이가 많은 해의 다음 해에는 반대가 더욱 심했다. 열대품종 유전자를 지닌 통일벼는 냉해에 약하다. 면사무소와 농촌지도소 직원이 나와 통일벼를 심지 않은 못자리를 장화발로 짓밟는 사례도 있었다. 마침내 정부는 통일벼 수매가를 대폭 인상하면서 농민 달래기에 나선다. 1974∼1976년 연평균 벼수매가 인상률은 이전의 두 배 정도인 27%에 달했다. 하지만 영욕의 통일벼는 1991년 쌀 자급 달성과 함께 보급이 중단되면서 자취를 감춘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남아시아에서 가능한 ‘논 3모작시대’가 열렸다고 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논에다 호밀(11~4월)과 조평벼(5~8월), 하파귀리(9~10월)를 이어 심어 3모작 재배에 성공했다. 1㏊당 연간 수익도 벼·보리 2모작 때보다 오히려 많다. 우리 논농사 역사에 또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조생종인 조평벼는 일반벼와 비교해 맛 차이도 거의 없다고 한다. 오늘날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을 넘어 ‘6차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생산의 1차와 가공의 2차, 음식·숙박관광업의 3차산업을 합친 개념이다.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 머잖아 또 다른 품종을 이용한 3모작도 가능해질 것이라니 가히 논농사의 무한 진화시대라 할 만하다.
정기홍 논설위원 hong@seoul.co.kr
통일벼는 1971년 ‘통일벼 박사’ 허문회 교수가 이끈 수원 농대(현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연구팀에 의해 개발돼 다음 해 농가에 보급됐다. 동남아시아 등 열대지역에 잘 적응하는 인디카 품종과 온대지역에서 주로 재배하는 자포니카 품종을 교잡한 것이다. 당시 통일벼는 ‘기적의 벼’로 불렸다. 하지만 보급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농가에서는 검증이 안 됐다며 재배를 기피했다. 통일벼가 보급되기 전에는 밥알에 윤기가 있고, 맛 또한 좋은 ‘아끼바레’(秋晴)란 일반벼 품종을 주로 심었다. 당시 두 품종의 품질 차를 빗대 정부미(통일벼)와 일반미(아끼바레)로 불리기도 했다. 여름 냉해가 심해 쭉정이가 많은 해의 다음 해에는 반대가 더욱 심했다. 열대품종 유전자를 지닌 통일벼는 냉해에 약하다. 면사무소와 농촌지도소 직원이 나와 통일벼를 심지 않은 못자리를 장화발로 짓밟는 사례도 있었다. 마침내 정부는 통일벼 수매가를 대폭 인상하면서 농민 달래기에 나선다. 1974∼1976년 연평균 벼수매가 인상률은 이전의 두 배 정도인 27%에 달했다. 하지만 영욕의 통일벼는 1991년 쌀 자급 달성과 함께 보급이 중단되면서 자취를 감춘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남아시아에서 가능한 ‘논 3모작시대’가 열렸다고 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논에다 호밀(11~4월)과 조평벼(5~8월), 하파귀리(9~10월)를 이어 심어 3모작 재배에 성공했다. 1㏊당 연간 수익도 벼·보리 2모작 때보다 오히려 많다. 우리 논농사 역사에 또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조생종인 조평벼는 일반벼와 비교해 맛 차이도 거의 없다고 한다. 오늘날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을 넘어 ‘6차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생산의 1차와 가공의 2차, 음식·숙박관광업의 3차산업을 합친 개념이다.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 머잖아 또 다른 품종을 이용한 3모작도 가능해질 것이라니 가히 논농사의 무한 진화시대라 할 만하다.
정기홍 논설위원 hong@seoul.co.kr
2013-12-14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