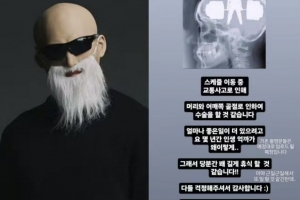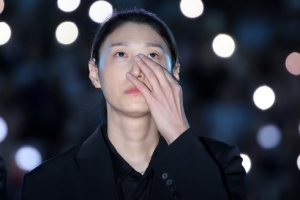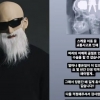손원천 문화부 선임기자
그 종이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매체가 신문과 책이다. 그러니 신문의 몰락을 논하는 말을 자주 듣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물론 책도 예외일 순 없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얼마 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인의 하루 평균 독서 시간은 평일 26분이었다. 이에 견줘 인터넷은 2.3시간, 스마트폰은 1.6시간에 달했다. 독서 시간이 줄다 보니 출판 시장도 덩달아 불황의 늪에서 허덕댄다.
한데 최근 들었던 한 강의는 스러져가는 종이의 가치를 되새기기에 충분했다. ‘뇌 과학으로 본 셀프 리더십’이란 제목의 강연이었다. 요지는 이렇다. 영상매체를 통해 전달된 정보는 뇌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전자책의 경우처럼 뇌가 보는 것 자체에만 치중하기 때문이다. 반면 신문이나 책을 통해 글을 읽으면 머리 앞쪽, 그러니까 전두엽에 오래 저장된다. 아울러 상상력과 창의력이 커지는 등 어린이들의 뇌 발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강연은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스마트 시대’에 쌓인 피로를 풀려는 노력들이 사회 저변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게 놀랍고 또 다행스럽다.
이 대목에서 자연스레 ‘앞쪽형 인간’이 떠오른다. 2008년 나덕렬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가 출간한 동명의 책이 베스트 셀러가 되면서 유행했던 용어다. 뇌에는 앞과 뒤가 있는데 뒤쪽 뇌는 충동과 욕구 등 인간의 희로애락을 담당한다. 감각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한다. 반면 앞쪽 뇌는 뒤쪽 뇌에 저장된 정보를 종합 편집한다. 행동을 결정하고 충동이나 욕구를 조절하는 고차원적 업무를 담당한다. ‘앞쪽형 인간’은 앞쪽 뇌가 발달했다. 수동적 의존적인 ‘뒷쪽형 인간’에 견줘 창조적이고 능동적이다. 앞쪽형 인간이 되려면 평소 신문이나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게 책의 주장이다.
종이를 멀리하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치매’가 대표적이다.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뇌 기능 손상으로 인지 기능을 상실하는 일종의 치매다. 스마트 미디어들이 범람하는 마당에 머지않아 사회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쯤 되면 의문이 생긴다. 스마트 기기를 통해 길을 찾고 책을 읽고 세상을 보는 게 정말 ‘스마트한’ 삶일까. 엔지니어들이 모든 걸 통제하는 공간에서 나의 역할은 뭘까. 종이와 달리 디지털 시대에 스마트해지는 건 디지털 기기일 뿐 인간은 아닌 듯하다.
몸담고 있는 일터 얘기를 하자니 쑥스럽다. 제 자랑하는 것 같아 썩 내키지도 않는다. 한데 굳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까닭은 이제 우리 사회가 스마트 시대의 피로도를 정색하고 짚어볼 때가 됐다는 생각에서다. 디지털이 쌓은 피로를 치유하는 건 결국 아날로그일 터. 분명한 건 종이는 당신의 친구란 거다. 멀리한다고 친구가 당신을 욕할 리 없지만, 시간이 흘러 후회하는 건 친구를 멀리했던 당신일 수 있다.
angler@seoul.co.kr
2013-11-26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