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깃을 사랑한 킬러
어시장에서 밤새도록 생선을 손질하는 류(왼쪽·기쿠치 린코)의 또 다른 직업은 전문 킬러. 아무리 짜내도 1%의 수분도 없을 듯한 메마른 표정의 류의 유일한 친구는 백발의 음향기사(다나카 민)뿐이다. 짬짬이 방아쇠를 당기고, 일터에서는 생선을 손질하는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던 류에게 어느 날 새로운 일감이 들어온다.

딸 미도리가 손목을 긋고 세상을 등진 후 식음을 전폐한 아버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연인이었던 스페인 남자 친구 데이빗(오른쪽·세르지 로페즈)을 세상에서 지워달라는 것. 류는 평소대로 ‘타깃’인 데이빗의 와인숍을 찾아갔지만, 운명적인 하룻밤을 보내면서 모든 것이 뒤틀린다.
‘격정 로맨스’란 타이틀을 달았지만 ‘시각적인 격정(?)’만 기대한다면 실망할 지도 모른다. 이 영화의 매력은 죽여야 할 남자를 사랑하게 된 여자의 미묘한 심리와 관계의 변화를 소리를 통해 접근한다는데 있다. 내레이션을 맡은 화자가 음향기사인 것과 무관하지 않을 터.
류와 데이빗이 처음 만난 날, 일본 라면을 먹으면서 데이빗은 류에게 “소리를 내지 않고 먹는 게 (일본에서는) 결례란 건 알지만 스페인에서는 매너를 지키는 일이다.”라고 말을 건넨다. 하지만 영화 말미에 데이빗은 홀로 라면을 먹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후루룩~’ 소리를 낸다. ‘당신을 찾아오는 그 여자(류)가 누구냐.’고 묻는 동료에게 ‘아무도 아니다.’(She´s nobody)라고 말했지만 이미 데이빗은 류에게 맞춰가고 있던 셈이다.
현실에선 성큼 떨어진 사랑 얘기다. 미국 할리우드의 기승전결에 익숙해진 관객에게는 친절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영화에서 눈을 뗄 수 없는 까닭은 상당 부분 여주인공에 있다. 결코 미인은 아니다. 카리스마도 없다. 하지만 미묘한 손끝의 떨림부터 입가의 흔들림까지, 그의 연기는 열 마디 대사 이상을 표현해 낸다.
1981년생. 일본에서 15살 때부터 연기를 시작했지만 그가 영화팬들에게 이름을 알린 건 2007년 브래드 피트와 함께 출연한 미국 영화 ‘바벨’을 통해서다. 할리우드 데뷔작인 이 영화에서 청각장애인의 복잡한 내면 연기를 무난하게 소화해 그 해 골든글러브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다. 4월 국내에서 개봉 예정인 무라카미 하루키 원작의 일본 영화 ‘상실의 시대’에서는 주인공 나오코 역을 맡았다.
스페인의 국가대표 감독인 페드로 알모도바르가 인정했다는 아자벨 코이셋 감독의 연출력도 두고봐야 할 대목이다. 굳이 ‘여성감독 특유의 섬세함’이란 표현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감정선과 소리를 엮는 그의 솜씨는 특별하다. 엔딩 자막이 올라간 뒤에도 재일교포 출신 고(故) 미소라 히바리 버전의 ‘라 비 앙 로즈’(장밋빛 인생)는 이명처럼 귓가에 남는다. 24일 개봉. 109분. 18세 관람가.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1-02-18 1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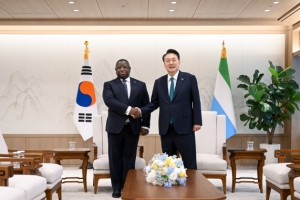












![전쟁·기후변화… 공멸해 가는 인류 깨우다[OTT 언박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2/16/SSC_20240216012138_N.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