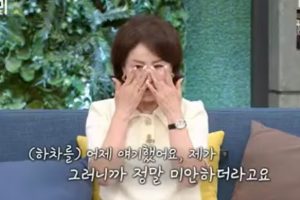김병철 한국필립모리스 전무·광고홍보학 박사
최근 야당의 ‘무상’ 시리즈를 놓고 포퓰리즘 논쟁이 한창이다. 세금으로 제공되는 것을 가지고 무상으로 포장한 것만으로도 포퓰리즘이라는 공격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정부여당은 이런 포퓰리즘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까. 몇 가지 측면에서 ‘억지 물가인상 억제’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먼저 일부 공공요금은 요금 현실화, 경영 합리화 대신 이용자와 업계의 반발이 무서워 ‘세금’으로 풀고 있다. 물가 자체보다는 물가를 잡는 방식을 ‘과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대대적인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여러 채널을 통해 시장에 더욱 강력히 개입하겠다는 신호를 내보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서민을 한숨짓게 하는 신선식품 물가(작년 21.3% 상승)보다는 보여주기 쉬운 밀가루·설탕·식용유 등의 제조업체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설령 물가 안정에 대한 충정을 십분 살핀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좌고우면 대신 손쉬운 정책수단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을 갖게 한다.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선진화의 방향으로 ‘오픈 프라이스제’(판매가격 자율결정제도)를 꾸준히 확대 시행해 왔는데, 작금은 역행하고 있다. 또 시장에서 가격결정 주도권이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업체, 즉 대형마트·홈쇼핑·온라인판매점 등으로 넘어간 지도 오래됐다. 가격이 내려갈지 여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조업체에 부담을 더 안기는 형국이다.
이런 접근법으로는 인상 요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상을 단지 지연시키고 더 큰 인상을 잠복시킬 뿐이다. 언젠가는 억눌렸던 것들이 한꺼번에 더 큰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100원 올리면 될 것을 미뤄 두면 나중에는 500원을 올려야 한다. 아니면 그때는 한꺼번에 500원을 올리는 데 따른 ‘여론’이 무서워 결국 요금인상 대신 반발이 덜한 세금으로 보전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무상 복지가 무상이 아니라 세금복지이듯이 무리한 물가안정도 결국 세금을 통한 물가 안정, 왜곡된 시장의 비효율성을 낳게 되기 쉽다. 경제인에게 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주는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상징이다. 정치인에게 가격은 ‘표심’(票心)이라는 잣대가 하나 더 붙는지 모른다. 여야를 떠나 국가의 정책은 정치와 사회, 경제 전반을 두루 읽는 거시적 관점에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훌륭한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곱씹게 된다.
2011-02-11 3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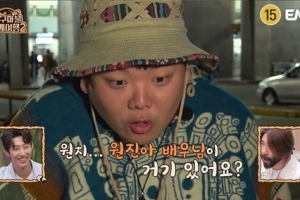



















![전쟁·기후변화… 공멸해 가는 인류 깨우다[OTT 언박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2/16/SSC_20240216012138_N.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