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에 밟히는 강화도의 정취와 역사
일상을 열고 나가면 거기에 여행이 있다.미지는 차창을 열고 부드러운 바람의 저편으로 이어진다.
여행은 매혹이라는 이정표에 이끌려가는 것.
정해진 시간을 가로질러 공간이 마음에 반사될 때 비로소 여행은 추억으로 각인된다.
내가 아닌 또 다른 나를 만나고 싶을 때, 거기서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 것이다.
6월은 한 해의 가장 풍요로운 정점이다.
1월과 12월 사이, 과거도 미래도 후회도 희망도 선뜻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그 자체가 여정이고 서사이다.
일주일이 생각 없이 지나가고 어느덧 일요일 아침, 주섬주섬 가방을 챙긴다.
시간의 제약은 그 반대급부로 마음에서 가장 먼 섬을 찾아가기로 한다.
강화도.


해변을 걷는 가족이 평화롭다
사람과 사람의 마음도 무의식이라는 대륙으로 이어져 있다. 그러니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모두 진실은 아니다. 바다는 그 진실의 여백이다. 강화도도 처음에는 뭍이었다.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 그 사이 물이 흐르고 그 골이 깊게 패여 강을 이루다 끝내 바다와 만났다. 오랜 침식작용으로 김포반도에서 떨어져 외따로이 구릉성 섬이 된 것이다. 문명은 이 뭍과 섬을 스테이플러처럼 대교로 고정시켜 놓았다. 일산대교를 건너며 다리 아래 수없이 밀려가는 강물을 굽어본다. 삶과 죽음 사이에도 이처럼 수많은 시간이 흘러갔을까.


벤치와 소나무가 정겹다
활자 밖으로 나온 시간들
강화도에 이르는 초지대교를 건너기 전 대명포구에 발길이 멈춘다. 강화도로 가는 김포시에서 하나밖에 없는 포구이다. 새로 지은 어시장 너머 낡은 군함이 한 척 보인다. 퇴역 상륙함 운봉함이다. 바다에서 52년 동안 높은 파도를 버티다가 제 몸을 끝내 이곳에 묶었다. 얼마 후면 함상공원으로서의 또 다른 생을 준비할 것이다. 새로 지은 어시장 안은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생선들로 즐비하다. 꽃게, 광어, 숭어, 삼식이 등을 비롯해 새우젓과 멸치젓이 지나는 이의 눈길을 붙든다. 밖에 나와 하늘을 보니 어시장 지붕 위로 갈매기들이 줄지어 앉아 있다. 한가로운 햇살, 살랑거리는 바람, 그 사이로 리어카의 경음악이 간간이 끼어든다. 갈매기들은 제 발톱으로 붉은 지붕을 쥐고 먼먼 바다로 날아오른다. 강화도 가는 도로 옆 풀어 놓은 그물마저 누구의 기억을 낚고 있는지, 왠지 모를 눈부심이 셔터에 닿는다.
초지진의 퇴색한 성벽의 무늬처럼 강화도는 외세에 대한 저항이 치열했던 곳이다. 강화도에는 조선시대 바닷가 경비를 위해 12진·보(진은 대대 규모, 보는 중대 규모)와 소형 진지인 53돈대가 있다. 몽고에 이어 병인양요(1866년), 신미양요(1871년) 구한말 외세침략에 이르기까지 강화도는 묵묵히 곳곳에 역사를 새기며 버텨왔다. 50톤에 이르는 부근리 고인돌(강화도에는 고인돌이 130개가 넘는다)이 그 오랜 무게임을 알 것도 같다. 그중 덕성리의 광성보가 인상 깊다. 신미양요 당시 광성보에서 어재연 장군과 300여 명의 무사들이 미군과 끝까지 맞서다 포로 되기를 거부하고 모두 순국하였다. 역사는 종종 활자 밖으로 나와 그날의 시간을 거느린다. 당시의 함성과 처절한 저항이 깃든 깃발이 136년이 지나서야 애나폴리스 미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서 돌아왔다. 전리품으로 뺏겼던 가로, 세로 각 4.5m의 수(帥)자가 씌어 있는 깃발이 다시 이곳에서 바람을 불러들였을 것이다. 그래서 광성보와 초지진의 해질녘 풍경은 강화도에서 가장 처연하도록 아름다운 경관에 속한다.
강화도에 오게 되면 전등사를 빼놓을 수 없다. 오르는 초입부터 ‘참 좋은 인연입니다’라는 글귀가 차향기로 이어진다. 죽림다원. 지붕이 된 느티나무 아래 다원의 풍경이 이채롭다. 전등사는 고구려 소수림왕(서기 381년) 때 지어졌다. 한국 불교 전래 초기의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도량이다. 전등사의 대웅보전(보물 제178호)은 나부상으로 유명한 곳이다. 대웅보전 지붕 네 귀퉁이를 떠받치고 있는 여인이 발가벗고 벌을 서듯 있기 때문이다. 절을 짓던 목수를 배신하고 떠나간 여인을 조각한 것이라 한다.
남서쪽으로 향하다 보면 선두리선착장이 나온다. 마니산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선착장이다. 선주들이 직접 운영하는 횟집이 예닐곱 개 이어져 있고 그 너머로 방파제가 길게 뻗어 있다. 어디서 자라왔는지 전깃줄도 그곳에서 멈췄다. 멀리 메마른 수초들이 바다와 교신하듯 흔들린다. 갯벌에 모로 누운 배들도 제각각 그리움처럼 청신한 하늘색을 지녔다. 밀물이 밀려오면 그 색에 맞는 파도를 입을 것이다. 이곳에서는 조개를 캐는 아낙마저 왠지 모를 쓸쓸함의 깊이에 있다. 곡진하게 갈고리로 파놓은 주변이 모두 진회색 고요이다. 비로소 나를 갈아엎는 시간이다.


선두리 선착장의 배들의 고요
강화도의 맛, 밴댕이
강화도에는 미각을 돋우는 것들이 많다. 6월에는 ‘밴댕이’가 유명하다. 밴댕이가 남쪽 해안을 따라 강화도에 이르는 동안 제법 씨알이 굵어지기 때문이다.


선두리 선착장에서 말라가는 조기들


조개캐는 아낙의 손길이 분주하다
어느덧 곡선 길을 따라 동막으로 향한다. 섬의 남쪽 동막해수욕장은 길이 4km의 갯벌과 모래사장, 솔밭이 드리워진 해변이다. 썰물로 밀려나간 너른 곳에 밤하늘 같은 갯벌이 펼쳐진다. 바다가 보듬은 결이 고스란히 갯벌에 남아 있다. 아니 바다를 기다리는 것은 갯벌이 아니라 갯벌 속 조개이며 게며, 낙지일지 모른다. 강화도가 포함된 서해는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이다. 동막해수욕장에서는 지금껏 딱딱한 길을 안내했던 신발을 벗고 갯벌을 걸어보아야 한다. 맨발에 느껴지는 촉촉한 흙의 감촉. 거대한 산이 모래와 점토가 되기까지 그 오랜 날들이 부드럽게 스친다. 발가락 하나 하나 어루만지듯 비집고 나오는 갯벌을 걷다보면 시간의 부드러움에 대하여, 자연의 경이로움에 대하여 문득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장봉도 너머 저녁놀의 붉음 속으로 어느덧 우리의 마음도 황홀하게 저물어가고 있음을 발견한다.
글·사진 윤성택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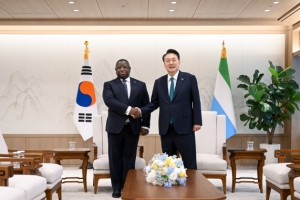










![전쟁·기후변화… 공멸해 가는 인류 깨우다[OTT 언박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2/16/SSC_20240216012138_N.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