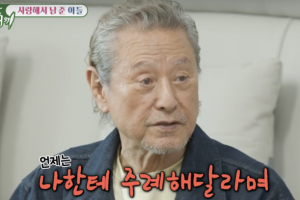황금 들녘이 초가을 바람에 일렁인다.올해도 괜찮은 수준의 풍작이라는 게 농림부의 전망이다.‘밥 안 먹는 세상’이 돼버려 쌀의 의미를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에 견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풍년은 여전히 우리를 기쁘게 한다.
하지만 농민들의 입에서는 풍년가 대신 탄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 이후 우리 쌀 시장의 방파제 역할을 해온 ‘관세화 유예조치’가 올해로 유효기간 10년을 마감하기 때문이다.
쌀 시장 개방 협상을 연내에 마쳐야 하고,그 결과에 따라 ‘제2의 개방파고’가 몰아칠 것이 분명해 걱정이 태산이다.더구나 정부의 협상 전략이 ‘일본식 전면개방’도 불사한다는 것이어서 농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크다.
정부는 그동안 관세화 유예를 고집해 왔다.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일정한 양(MMA)만 수입해 그나마 우리 농민의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다.그러나 이같은 방식을 포기하고,일본처럼 높은 관세를 부과하되 수입량은 제한하지 않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물론 정부의 이같은 고려 뒤에는 협상에서 중국 등 쌀 수출국들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만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가 몇년 더 연장되더라도 매년 양을 늘려가며 쌀 수입은 해야 한다.관세화 유예가 쌀 시장 개방을 막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쌀 수입량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경우 상응하는 대가는 치러야 한다.
새 카드로 떠오른 관세화는 일본이 1999년 예정보다 일찍 쌀 시장을 개방하면서 채택한 방식이다.일본이 다소의 잔꾀를 동원해 초기에 1250%란 고율의 관세를 매겨 쌀 개방 파고를 이겨냈지만 이제 우리도 이를 원용할 필요가 커졌다.전문가들은 일본을 ‘인접국 사례’로 활용할 경우 최소한 380∼450%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이렇게 될 경우 밥을 지으면 쉽게 퍼지는 중국산 쌀을 국산 일반미와 엇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싼 값에 사야 하는 상황이 된다.중국 쌀이 국내에서 시장 경쟁력을 갖기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고관세화가 중국 등 쌀 수출국들에 대한 ‘반격카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또 관세화를 시행하면 농업 전 부문에 걸쳐 협상하는 도하개발어젠다(DDA)가 타결될 때까지 MMA 물량을 더 이상 늘리지 않아도 되는 부수 효과도 있다.
정부 협상팀 주변에서는 “미국이 광우병으로 금지된 쇠고기 수입을 재개해 달라고 하고,중국이 마늘·참깨 등의 무제한 수입 허용을 요구하는 등 개방 압력의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말이 흘러나온다.사실 UR 타결 이후 10년간 수입된 쌀의 양도 만만치 않다.첫해인 지난 95년 국내 소비량의 1%인 5만 1000t이었던 것이 올해는 약 4%인 20만 5000t에 도달했다.이를 5t 트럭에 나눠 실으면 서울∼대구간을 이을 수 있는 양이다.정부가 농지제도개선 등 약 119조원이 들어가는 농촌종합대책을 수립해 두고 있지만 왜 농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는지 짐작케 된다.자신들의 논을 트랙터로 갈아 엎은 농민들은 10일 전국 100여 시·군에서 “식량 주권의 보루인 쌀 시장만은 지켜야 한다.”며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어쨌든 이제는 관세화 유예와 일본식 개방의 갈림길에서 실익을 꼼꼼히 따져 내부 결론을 내려야 할 때다.이를 위해 정부는 쌀 협상의 과정과 득실을 농민들과 투명하게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농심이 풀려야 쌀 협상도 합리적으로 풀리며,농업의 미래도 풀린다.정부와 농민이 머리를 맞대고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이유다.
조명환 경제부장 river@seoul.co.kr
하지만 농민들의 입에서는 풍년가 대신 탄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 이후 우리 쌀 시장의 방파제 역할을 해온 ‘관세화 유예조치’가 올해로 유효기간 10년을 마감하기 때문이다.
쌀 시장 개방 협상을 연내에 마쳐야 하고,그 결과에 따라 ‘제2의 개방파고’가 몰아칠 것이 분명해 걱정이 태산이다.더구나 정부의 협상 전략이 ‘일본식 전면개방’도 불사한다는 것이어서 농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크다.
정부는 그동안 관세화 유예를 고집해 왔다.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일정한 양(MMA)만 수입해 그나마 우리 농민의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다.그러나 이같은 방식을 포기하고,일본처럼 높은 관세를 부과하되 수입량은 제한하지 않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물론 정부의 이같은 고려 뒤에는 협상에서 중국 등 쌀 수출국들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만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가 몇년 더 연장되더라도 매년 양을 늘려가며 쌀 수입은 해야 한다.관세화 유예가 쌀 시장 개방을 막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쌀 수입량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경우 상응하는 대가는 치러야 한다.
새 카드로 떠오른 관세화는 일본이 1999년 예정보다 일찍 쌀 시장을 개방하면서 채택한 방식이다.일본이 다소의 잔꾀를 동원해 초기에 1250%란 고율의 관세를 매겨 쌀 개방 파고를 이겨냈지만 이제 우리도 이를 원용할 필요가 커졌다.전문가들은 일본을 ‘인접국 사례’로 활용할 경우 최소한 380∼450%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이렇게 될 경우 밥을 지으면 쉽게 퍼지는 중국산 쌀을 국산 일반미와 엇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싼 값에 사야 하는 상황이 된다.중국 쌀이 국내에서 시장 경쟁력을 갖기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고관세화가 중국 등 쌀 수출국들에 대한 ‘반격카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또 관세화를 시행하면 농업 전 부문에 걸쳐 협상하는 도하개발어젠다(DDA)가 타결될 때까지 MMA 물량을 더 이상 늘리지 않아도 되는 부수 효과도 있다.
정부 협상팀 주변에서는 “미국이 광우병으로 금지된 쇠고기 수입을 재개해 달라고 하고,중국이 마늘·참깨 등의 무제한 수입 허용을 요구하는 등 개방 압력의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말이 흘러나온다.사실 UR 타결 이후 10년간 수입된 쌀의 양도 만만치 않다.첫해인 지난 95년 국내 소비량의 1%인 5만 1000t이었던 것이 올해는 약 4%인 20만 5000t에 도달했다.이를 5t 트럭에 나눠 실으면 서울∼대구간을 이을 수 있는 양이다.정부가 농지제도개선 등 약 119조원이 들어가는 농촌종합대책을 수립해 두고 있지만 왜 농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는지 짐작케 된다.자신들의 논을 트랙터로 갈아 엎은 농민들은 10일 전국 100여 시·군에서 “식량 주권의 보루인 쌀 시장만은 지켜야 한다.”며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어쨌든 이제는 관세화 유예와 일본식 개방의 갈림길에서 실익을 꼼꼼히 따져 내부 결론을 내려야 할 때다.이를 위해 정부는 쌀 협상의 과정과 득실을 농민들과 투명하게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농심이 풀려야 쌀 협상도 합리적으로 풀리며,농업의 미래도 풀린다.정부와 농민이 머리를 맞대고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이유다.
조명환 경제부장 river@seoul.co.kr
2004-09-10 3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