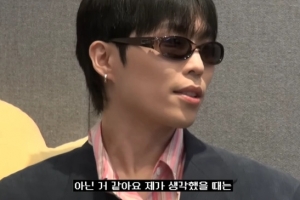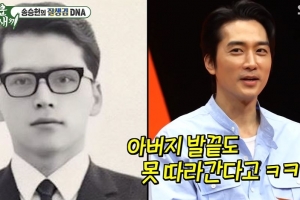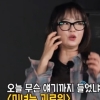“진리를 아는 방법은 오직 마음공부,즉 참선 뿐입니다.‘나는 무엇인가’ 묻는 데서 마음공부는 시작됩니다” ‘벽안(碧眼)의 불자’ 현각(玄覺·36) 스님이 속인들에게 가르침하나를 던졌다.5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다.
그는 앞으로 대중 앞에 드러내는 것을 많이 자제하겠다고 했다.수행에 정진하기 위해서란다.이날 그는 과학지식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지혜를 젊은 과학 영재들에게 깨우쳐 주었다.
나는 무엇인가.그는 ‘모른다’고 답했다.이 말이 존재를 가장 깊이이해하는 길이다. 모르는 마음이 ‘참 나’다.그렇지만 모르는 것,자체는 안다.여기서 마음공부가 시작된다.생각이 만들어지기 전이 사람의 본성품이다.그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사람들은 다람쥐와 같이 산다.쳇바퀴를 돌리듯 경쟁적으로 살아가며‘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진리를 찾고 싶었다”고 말했다.미국 뉴저지주의 독실한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나 되고 싶었던 신부를 포기한 것도,부유한 집안의 윤택한 삶을 마다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했다.
예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다.그러나 학교에서그 진리를 찾을 수 없다.학교수업은 지식만 가르칠 뿐이다.
예일대에서 철학을 배우고 유럽에 갔을 때 한 교수로부터 불교서적을 선물로 받았다.서양의 지식인들이 동양철학에 경도돼 가던 때였다.그래서 89년 하버드대 신학대학원에서 비교종교학을 공부했다.
그해 말 화계사 숭산(崇山)스님의 강연을 듣고 마음이 열렸다.그건‘죽은 말’이 아니라 단전에서 나오는 말이었다.사구(死句)가 아니라 활구(活句)였다.지식과 진리의 차이를 처음 느꼈다.오직 이 순간을 사는 존재의 마음이 진리다.이 때 예수님의 뜻에 다가갈 수 있는방법을 불교에서 찾았다.기독교는 지도자들이 길을 보여주지 않고 ‘오직 믿어라’라고 말해 만족을 주지 못했다.이후 철학책을 집어 던졌다.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와 선불교에 입문,구도자의 길을 걸었다.벌써9년째다.‘왜 사나,왜 먹나,왜 죽어야 하나’는 원천적 공포로 벗어날 수 있었다.그는 해탈을 “나는 지금 여기에서 강의하고 있다”라고 정의했다.들을 땐 들을 뿐,볼 때는 볼 뿐,마실 땐 마실 뿐,오직 ‘할 뿐’이란 마음으로 사는 게 진리라고 했다.
그는 “마음을 만들지 마라”고 말했다. 맹목적 믿음이 예루살렘을가장 폭력적 도시로 만들었다.종교는 중요하지 않다.마음공부가 더중요하다.
현각스님은 “9시 TV뉴스가 금강경보다도 더 재미있다”며 한나라당,민주당으로 나눠 지역당을 고집하고 싸우는 것 또한 맹신이라고꼬집었다.종교는 경계를 만들고 맹신은 고집을 낳는다.그러면 보는 세상도 좁아진다.
“서양문화에는 명상방법이 없어 마음을 가르쳐주는 곳이 없다”라고도 말했다.동양사상이 서양의 지식인과 리처드 기어,해리슨 포드,리키 마틴 등 스타에게 인기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거꾸로 한국은 서양화하고 있다.국가발전을 위해서라고 하고 있지만급격한 변화는 곤란하다고 그는 진단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신세대과학도들은 그의 재담에 웃음과 박수로 답했다.
현각스님은 이날 강의를 들으러온 이들에게 “한국전통을 버리지 마라”고 일침한 뒤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충남 계룡산 무상사 수행지로떠났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 현각스님 약력 ▲1964년 미국 뉴저지 가톨릭 집안에서 출생 ▲87년 예일대 졸업(문학·철학 전공) ▲89년 하버드대 신학대학원 입학(비교종교학 공부) ▲90년 11월 첫 방한,신원사 동안거■저서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숭산 스님의 설법집 ‘선의 나침반’‘세계일화’‘오직 모를 뿐’ 영역
그는 앞으로 대중 앞에 드러내는 것을 많이 자제하겠다고 했다.수행에 정진하기 위해서란다.이날 그는 과학지식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지혜를 젊은 과학 영재들에게 깨우쳐 주었다.
나는 무엇인가.그는 ‘모른다’고 답했다.이 말이 존재를 가장 깊이이해하는 길이다. 모르는 마음이 ‘참 나’다.그렇지만 모르는 것,자체는 안다.여기서 마음공부가 시작된다.생각이 만들어지기 전이 사람의 본성품이다.그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사람들은 다람쥐와 같이 산다.쳇바퀴를 돌리듯 경쟁적으로 살아가며‘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진리를 찾고 싶었다”고 말했다.미국 뉴저지주의 독실한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나 되고 싶었던 신부를 포기한 것도,부유한 집안의 윤택한 삶을 마다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했다.
예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다.그러나 학교에서그 진리를 찾을 수 없다.학교수업은 지식만 가르칠 뿐이다.
예일대에서 철학을 배우고 유럽에 갔을 때 한 교수로부터 불교서적을 선물로 받았다.서양의 지식인들이 동양철학에 경도돼 가던 때였다.그래서 89년 하버드대 신학대학원에서 비교종교학을 공부했다.
그해 말 화계사 숭산(崇山)스님의 강연을 듣고 마음이 열렸다.그건‘죽은 말’이 아니라 단전에서 나오는 말이었다.사구(死句)가 아니라 활구(活句)였다.지식과 진리의 차이를 처음 느꼈다.오직 이 순간을 사는 존재의 마음이 진리다.이 때 예수님의 뜻에 다가갈 수 있는방법을 불교에서 찾았다.기독교는 지도자들이 길을 보여주지 않고 ‘오직 믿어라’라고 말해 만족을 주지 못했다.이후 철학책을 집어 던졌다.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와 선불교에 입문,구도자의 길을 걸었다.벌써9년째다.‘왜 사나,왜 먹나,왜 죽어야 하나’는 원천적 공포로 벗어날 수 있었다.그는 해탈을 “나는 지금 여기에서 강의하고 있다”라고 정의했다.들을 땐 들을 뿐,볼 때는 볼 뿐,마실 땐 마실 뿐,오직 ‘할 뿐’이란 마음으로 사는 게 진리라고 했다.
그는 “마음을 만들지 마라”고 말했다. 맹목적 믿음이 예루살렘을가장 폭력적 도시로 만들었다.종교는 중요하지 않다.마음공부가 더중요하다.
현각스님은 “9시 TV뉴스가 금강경보다도 더 재미있다”며 한나라당,민주당으로 나눠 지역당을 고집하고 싸우는 것 또한 맹신이라고꼬집었다.종교는 경계를 만들고 맹신은 고집을 낳는다.그러면 보는 세상도 좁아진다.
“서양문화에는 명상방법이 없어 마음을 가르쳐주는 곳이 없다”라고도 말했다.동양사상이 서양의 지식인과 리처드 기어,해리슨 포드,리키 마틴 등 스타에게 인기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거꾸로 한국은 서양화하고 있다.국가발전을 위해서라고 하고 있지만급격한 변화는 곤란하다고 그는 진단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신세대과학도들은 그의 재담에 웃음과 박수로 답했다.
현각스님은 이날 강의를 들으러온 이들에게 “한국전통을 버리지 마라”고 일침한 뒤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충남 계룡산 무상사 수행지로떠났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 현각스님 약력 ▲1964년 미국 뉴저지 가톨릭 집안에서 출생 ▲87년 예일대 졸업(문학·철학 전공) ▲89년 하버드대 신학대학원 입학(비교종교학 공부) ▲90년 11월 첫 방한,신원사 동안거■저서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숭산 스님의 설법집 ‘선의 나침반’‘세계일화’‘오직 모를 뿐’ 영역
2000-10-07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