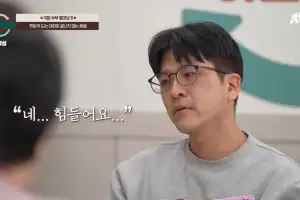■'이렇게 좋은 자수'펴낸 허동화 한국자수박물관장.
서울대 국문과 조동일교수는 “남자 같은 여자와 여자 같은 남자가 소설을 잘 쓴다”라며 작가 박경리여사와 고 황순원씨를 예로 든 적이 있다.대립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사람이 상상력이 뛰어나다는 논리다.여기에 딱 어울리는 사람이 허동화 한국자수박물관장이다.
자수(刺繡)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여성이다.고정관념을 비웃듯 ‘남자’ 허 관장은 자수,보자기 등 ‘규방문화’에 30년째 무한한 사랑을 쏟아붓고 있다.
그가 최근 ‘이렇게 좋은 자수’‘이렇게 고운 색’(현암사)을 두 권을 펴냈다.23년 전 ‘한국의 자수’(삼성출판사)를 지은 뒤 ‘옛 보자기’(88년 한국자수박물관) 등에 이어 여덟번째 ‘규방문화 짝사랑’을 고백한 셈이다.
10년 동안 준비한 뒤 1년은 꼬박 매달려 만들었다는 ‘이렇게 좋은 자수’는 자신이 운영하는 박물관 소장품 가운데 보물 제563호인 ‘사계분경도(四季盆景圖)4첩’을 비롯,한국전통자수를 대표하는 200여점을 수록했다.
‘이렇게 고운 색’은 자수를자수답게 하는 한국전통색을한 자리에 모은 것이다.허 관장은 “마법사의 손놀림 같은독특한 색채미를 창출한 옛 여성의 빼어난 슬기에 저절로 머리를 숙이게 되었다”고 서문에서 심경을 밝혔다.
서울의 한 레스토랑에서 그를 만났다.먼저 책에 영어를 병기한 이유를 물었더니 “세계화 운운하며 새 상품을 찾는 것도 좋지만 ‘이미 세계화 된 것’에 관심갖는 게 더 중요하다”며 “도자기·불교에 국한된 ‘세계적인 우리 것’ 리스트에 ‘자수’와 ‘색’을 보탤 수 있다는 자부심을 담았다”고 말한다.
조리있는 말솜씨에 차분하고 나긋나긋한 음성.자수와는 천상배필이라고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치를 제시했다.독일 영국프랑스 미국 벨기에 호주 등 구미의 유명한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가진 총 30여차례의 해외전시와 600만여명의 관람객….
“이쯤되면 자수가 당당히 세계화의 대표주자가 될 수 있지않느냐”고 반문했다.“박물관의 역할인 수집,조사·연구,전시 면에서 누구 못지않게 충실했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수집 이야기를꺼내면서 자부심과 보람의 뒷켠에 숨은 고충을 털어놓았다.“골동품 상인들이 지어준 별명이 ‘넝마주이’입니다.자수만 보면 깨끗하지만 원료 상태는 먼지 투성이의 헝겊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면 옷은 먼지로 뒤덮히고걸레가 되기 십상이죠.” 지천명을 목전에 둔 49세 때 자수의 세계에 뛰어들었다.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학 석사를 취득한 그가 한국전력에서 이사 감사를 지낸 뒤였다.
망설이다 ‘남자’와 ‘자수’가 만난 이유를 물었다.“색채 감각이 특별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성격도 세심한 편이어서 여성문화에 관심이 많았죠.게다가 70년대 중반만 해도 자수는 버려진 분야라 쉽게 접근할 수 있었죠.” 골동품가에서 불리는 그의 별명이 ‘여학생’이라고 귀띔한다.오늘의 그가 있기까지 공식 지원은 ‘가뭄에 콩’이었다.사립박물관은 정책적인 지원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이다.
“기업과 문화지원을 내건 ‘메세나협회’를 찾아가도 ‘안 줄 궁리만 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박물관은 매년 1억원의 적자를 내지만 정작그의 셈법은 다르다.
“25년 문열었으니 적자가 25억원입니다.그러나 수익이 전혀 없는 30여 차례 해외전시 효과를 돈으로 환산할 경우 150억여원이나 됩니다.오히려 125억원을 번게 아닙니까.” 그러나 자조적인 말처럼 들렸다.
“하지만 영원한 지원자인 내 아내가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치과의사인 동반자 박용숙의 경제적·정신적 지원이 없었으면 그의 작업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이종수기자 vielee@
서울대 국문과 조동일교수는 “남자 같은 여자와 여자 같은 남자가 소설을 잘 쓴다”라며 작가 박경리여사와 고 황순원씨를 예로 든 적이 있다.대립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사람이 상상력이 뛰어나다는 논리다.여기에 딱 어울리는 사람이 허동화 한국자수박물관장이다.
자수(刺繡)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여성이다.고정관념을 비웃듯 ‘남자’ 허 관장은 자수,보자기 등 ‘규방문화’에 30년째 무한한 사랑을 쏟아붓고 있다.
그가 최근 ‘이렇게 좋은 자수’‘이렇게 고운 색’(현암사)을 두 권을 펴냈다.23년 전 ‘한국의 자수’(삼성출판사)를 지은 뒤 ‘옛 보자기’(88년 한국자수박물관) 등에 이어 여덟번째 ‘규방문화 짝사랑’을 고백한 셈이다.
10년 동안 준비한 뒤 1년은 꼬박 매달려 만들었다는 ‘이렇게 좋은 자수’는 자신이 운영하는 박물관 소장품 가운데 보물 제563호인 ‘사계분경도(四季盆景圖)4첩’을 비롯,한국전통자수를 대표하는 200여점을 수록했다.
‘이렇게 고운 색’은 자수를자수답게 하는 한국전통색을한 자리에 모은 것이다.허 관장은 “마법사의 손놀림 같은독특한 색채미를 창출한 옛 여성의 빼어난 슬기에 저절로 머리를 숙이게 되었다”고 서문에서 심경을 밝혔다.
서울의 한 레스토랑에서 그를 만났다.먼저 책에 영어를 병기한 이유를 물었더니 “세계화 운운하며 새 상품을 찾는 것도 좋지만 ‘이미 세계화 된 것’에 관심갖는 게 더 중요하다”며 “도자기·불교에 국한된 ‘세계적인 우리 것’ 리스트에 ‘자수’와 ‘색’을 보탤 수 있다는 자부심을 담았다”고 말한다.
조리있는 말솜씨에 차분하고 나긋나긋한 음성.자수와는 천상배필이라고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치를 제시했다.독일 영국프랑스 미국 벨기에 호주 등 구미의 유명한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가진 총 30여차례의 해외전시와 600만여명의 관람객….
“이쯤되면 자수가 당당히 세계화의 대표주자가 될 수 있지않느냐”고 반문했다.“박물관의 역할인 수집,조사·연구,전시 면에서 누구 못지않게 충실했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수집 이야기를꺼내면서 자부심과 보람의 뒷켠에 숨은 고충을 털어놓았다.“골동품 상인들이 지어준 별명이 ‘넝마주이’입니다.자수만 보면 깨끗하지만 원료 상태는 먼지 투성이의 헝겊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면 옷은 먼지로 뒤덮히고걸레가 되기 십상이죠.” 지천명을 목전에 둔 49세 때 자수의 세계에 뛰어들었다.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학 석사를 취득한 그가 한국전력에서 이사 감사를 지낸 뒤였다.
망설이다 ‘남자’와 ‘자수’가 만난 이유를 물었다.“색채 감각이 특별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성격도 세심한 편이어서 여성문화에 관심이 많았죠.게다가 70년대 중반만 해도 자수는 버려진 분야라 쉽게 접근할 수 있었죠.” 골동품가에서 불리는 그의 별명이 ‘여학생’이라고 귀띔한다.오늘의 그가 있기까지 공식 지원은 ‘가뭄에 콩’이었다.사립박물관은 정책적인 지원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이다.
“기업과 문화지원을 내건 ‘메세나협회’를 찾아가도 ‘안 줄 궁리만 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박물관은 매년 1억원의 적자를 내지만 정작그의 셈법은 다르다.
“25년 문열었으니 적자가 25억원입니다.그러나 수익이 전혀 없는 30여 차례 해외전시 효과를 돈으로 환산할 경우 150억여원이나 됩니다.오히려 125억원을 번게 아닙니까.” 그러나 자조적인 말처럼 들렸다.
“하지만 영원한 지원자인 내 아내가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치과의사인 동반자 박용숙의 경제적·정신적 지원이 없었으면 그의 작업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이종수기자 vielee@
2001-10-25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