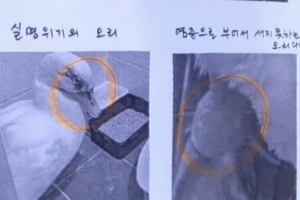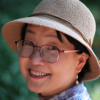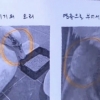중앙대 서양화과 대학원 졸업, 홍익대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중앙대 예술대학 미술학부 교수. 한남동 필갤러리, 상곡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에서 개인전.

정영한 ‘우리 시대 신화’, 캔버스에 유채, 162.1×97㎝
중앙대 서양화과 대학원 졸업, 홍익대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중앙대 예술대학 미술학부 교수. 한남동 필갤러리, 상곡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에서 개인전.
중앙대 서양화과 대학원 졸업, 홍익대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중앙대 예술대학 미술학부 교수. 한남동 필갤러리, 상곡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에서 개인전.
김병호
내가 다 늙어 가는 사이
그믐 말고 초사흘쯤 지나는 달빛으로
한자리에 고이는 일도 없이
처마 끝 빈 새장처럼 움푹 패인 울음
음정과 박자를 잃은 거짓말
첫서리 같은 이름을 더듬는 마음의 바닥
잠시 슬펐다가 외롭다가 다시, 고요해지는 사이
뿔 달린 짐승의 눈망울처럼 새벽이 지고
애먼 이 하나 없는 먼 길이 앞에 놓이고
어느새 빈 뜰에 내리는 빗줄기를 쳐다보는 일처럼
새까맣게 닳아버린 당신의
창가에서, 혼잣말처럼 썩어가는 모과
‘아무도 없어요?’라고 할 때 아무는 특정하지 않은 누군가를 가리킨다. ‘아무’가 관형사로 쓰일 때는 없다, 않다, 못하다 같은 부정어와 자주 짝지어진다. 전혀 어떠하지 않다란 뜻이다. ‘아무의 모과’는 특별할 것이 없는 모과라는 뜻과 누군가의 모과라는 이중의 뜻을 품는다. 나는 “당신의 창가에서” 썩어 가는 ‘아무의 모과’를 떠올린다. 세월이 흘렀으니 아무렇지도 않을 법도 하련만, 당신은 아직 내 마음의 바닥에 남은 “첫서리 같은 이름”이다.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빈 뜰에 내리는 빗줄기를 쳐다보는 일”이라고 말한다. 오래 되어 아련한 사랑이란 게 이런 것인가.
장석주 시인
2017-10-21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