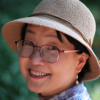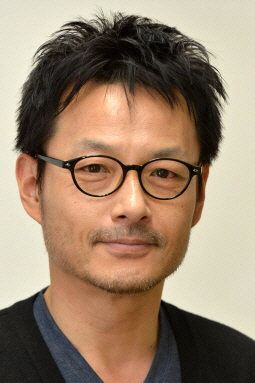
진경호 부국장 겸 사회부장
두려운 건 따로 있다. 국회다. 여야 의원 228명이 김영란법에 찬성표를 던진 지난 3일 무엇에 홀리거나 무엇에 쫓기거나, 이도저도 아니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줄지어 따라 걷는 ‘좀비’들의 행렬이 어른댄 국회의 영혼 없는 행태가 두렵다. 과잉입법이니, 연좌제 소지가 있느니,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느니 하는 논란이 들끓었지만 그들은 전원을 끄듯 고민을 딱 끊었다. 원내대표 둘이 법안에 합의했다는 ‘사실’ 하나를 면죄부로 움켜쥐고는 가결 처리를 향해 신속하게 대오를 정비했다.
금배지들의 이런 집단적 사고(思考) 정지엔 몇 가지 사유가 있을 듯하다. 내년 총선 공천을 떠올렸을 수 있다. 원내대표 합의는 무조건 따르고 보는 관성을 따랐을지도 모른다. 행여 반대했다가 반개혁 세력으로 찍힐 게 두려웠을 법도 하다. 여야 두 원내대표는 어땠을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선 집권 여당의 원내사령탑이 돼 처음 맞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한 건’이 필요했을 것이다. 민생법안들이 죄다 야당 반대에 막힌 마당에 김영란법이라도 건져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었을 것이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어떤가.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난을 뒤집어쓸 판에 김영란법을 마다할 까닭이 없다. “부족한 내용은 다시 개정하기로 원내대표끼리 어제 합의했다”는 우 원내대표의 발언은 두 사람의 허기(虛氣)를 여실히 보여 준다.
모두가 눈치를 봤고, 모두가 비겁했다. ‘김영란법’ 처리 다음날 마치 주술에서 풀린 듯 쏟아 낸 변명들이 이들의 비겁을 확증한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 대다수가 “법이 문제가 많다”고 했다. 언론의 질타 앞에서 밤새 다른 사람들이 돼 있었다.
표리부동의 이런 국회보다 더 두려운 건 어쩌면 입법 권력의 횡포라는 소리까지 듣는 이들조차 사실은 쇠락해 가는 권력일 뿐인 현실일 듯하다. 경제사회학자 모이제스 나임이 ‘권력의 종말’에서 설파했듯 권력 투쟁이 점점 격렬해지는 데 반해 권력의 힘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현실, 어렵게 권력을 쥐더라도 이를 휘두르기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현실이 우리가 정치를 생각하며 절로 한숨을 짓게 만드는 이유일지 모른다. 정점에 있던 권력이 점차 아래로 내려가 이젠 많은 이들이 권력을 나눠 쥐었지만, 그런 까닭에 누구도 힘을 쓰지 못한 채 ‘여론’이라는 변화무쌍의 절대권력 앞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된 현실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일지 모른다.
미래학자들이 진작 경고해 온 대의정치의 위기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이런저런 온라인 연결망으로 촘촘하게 묶인 다중은 더이상 힘없는 다수가 아니라 현안마다 적극 제 목소리를 내는 신권력으로 떠올랐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여론조사로 가리자고 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물색없는 발언은 ‘스마트몹’, 똑똑한 군중 앞에서 더는 자신을 포함한 정치인들이 국민을 대신할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함을 고백한 대의권(代議權)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 금배지를 반납하면서나 했어야 할 말이다. 국회선진화법 위헌심판 제청처럼 걸핏하면 정치가 법정 문턱을 넘나들고, 노무현 대통령 이후 ‘불통령’(不通領)이 대통령의 이웃말이 되고, 세월호 참사가 이념의 전장이 되고, ‘땅콩 회항’ 조현아의 ‘갑질’이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 것도 결국은 둘로 나누면 반이 아니라 무(無)가 되고 마는 속성으로 인해 권력 분산이 권력 부재로 변성(變性)돼 가는 현실을 보여 주는 증거들일 것이다.
뒤엉킨 ‘김영란법’에 대한 원작자 김영란 교수의 ‘감수’ 앞에서 정치권은 떨떠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자기결정 능력을 상실해 가는 국회는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허둥댈 것이다. 철 지난 정치를 비난할 시간이 없다. 신직접민주주의 시대에 부합할 정치의 틀을 고민할 때다.
jade@seoul.co.kr
2015-03-11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