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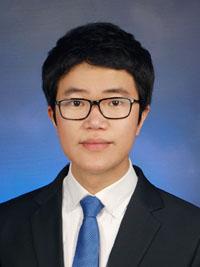
이성원 사회부 기자
재일교포가 누명을 쓰는 일도 잦았다. ‘한민통 간첩 사건’이 대표적이다. 1977년 반국가단체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수집했다는 혐의로 재일교포 유학생들이 간첩으로 몰렸다. 그러나 30여년이 흐른 2010년 3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들이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밝혀냈다.
이러한 과거 때문에 ‘간첩’하면 ‘조작’이란 단어가 반사적으로 떠오른다. 오늘날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공안당국이 짊어지고 가야 할 ‘업보’(業報)다. ‘간첩을 만들어 내는 이들’이 아니라 ‘간첩을 잡는 이들’로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대공수사는 더욱 치밀해야 하고 손톱만한 반론의 여지도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진짜 간첩을 잡아도 국민들로서는 또 조작한 것이 아닌지 의심부터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간첩 조작은 구시대의 악습만은 아닌 것 같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만 하더라도 그렇다. 백번 양보해 국정원이 간첩사건 자체를 조작한 게 아닌 증거만 꾸몄다 하더라도 협박과 회유를 통해 유우성씨 여동생의 자백을 이끌어 냈다는 점은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 ‘희생양’만 재일교포에서 탈북자로 바뀌었을 뿐이다.
수사의 허술함도 그대로다. 법원은 최근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 사건’의 피고인 홍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과 검찰이 확보한 홍씨의 자백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피고인이 국내법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 없이 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돼 조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면서 “방어권 역시 고지되지 않았거나 됐어도 불분명·불충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하소연한다. 법원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절차 위반을 문제 삼고 있으며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대공수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간첩들은 해안선 잠입 등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탈북자들 사이에 끼어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때문에 적발이 더 어려워졌다고 거듭 강조한다. 법원의 판단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달라져야 하는 건 법원이 아니라 공안당국이다. 시대가 달라졌는데도 여전히 피의자를 밀실에서 압박해 자백을 받아내는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고집한다면 ‘조작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법원을 탓하기보다 과학 수사를 앞세우고 절차를 지키며 증거를 확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대공수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아닐까 싶다.
lsw1469@seoul.co.kr
2014-09-15 30면





































